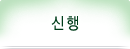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 |||
한파와 폭설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지역 강설량 25.8cm. 기상관측 이래 최대라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지 10여 일이 지났건만 서울시내 곳곳은 여전히 하얗다. 수온주도 곤두박질 쳐 이래저래 예사롭지 않은 겨울이다. 날씨가 춥다.
연일 TV 등 매스컴에서는 세종시와 관련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 만큼이나 민심도 곤두선 때다. 나그네가 길을 나선 때는 총리가 바싹바싹 타는 입을 적시며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던 날이었다.
600년 전 조선 태조 이성계가 민심을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 위해 찾은 서울은 나라의 중앙에 자리한 명당이었다. 서울은 음인 용이 백두산에서부터 온갖 변화를 하며 내려오고, 양인 물은 남한강 북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 한강을 이뤄 서울을 휘감은 산수교합, 음양교합의 터다. 북쪽으로는 북악산과 서쪽의 인왕산, 남쪽의 목멱산(남산), 동쪽의 낙산(동대문 근처)에 둘러싸인 곳이 경복궁이다.
청와대를 지나 부암동 고개를 넘었다. 고개 위로는 서울 시내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인 인왕스카이웨이가 고개 아래로는 자하문 터널이 지난다. 명당을 논할 때 말하는 ‘좌청룡 우백호’ 중 내백호(內白虎)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세검정 인근에 다다라 대원군의 별장이었던 석파랑이 보인다. 그 뒤가 마니사이다. 마니사는 인왕산의 깎아지른 듯한 산세에 인접한 곳으로 부암동 고갯마루 길과 세검정 사이에 위치한다.
나그네는 석파랑에 차를 대고 바로 옆 골목을 걸어 올랐다. 가파른 경사지만 다행히 사람이 다닐 만큼의 폭 이상 눈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골목의 막다른 곳에 다다랐다. 마니사다. 마니사의 ‘마니’는 광명진언에 보이는 말로 진주라는 뜻이다. 안에 들어서니 초목이 바위와 어우러지고 설경을 더한 것이 도심 속 절경이 따로 없다. 서울시내 이런 곳이 또 있을까? 문필봉을 중심으로 북한산이 한 눈에 들어온다.
서울 속 산사 마니사는 골목길 50여 미터를 사이에 두고 차들이 부대끼는 6차선 도로와 함께 있었다. “따로 세상은 있지만 인간세상은 아니다(別有天地非人間)”라는 말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마니사에서 현각 스님을 만났다.
전북 정읍에서 출생한 스님은 선친에게서 “군자가 되어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다(君子恥一物不知)”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다. 선친의 가르침은 소년이었던 스님의 지적 욕구를 자극했다. 소년은 무엇인가를 알려는 욕심, 지식에 대한 욕망을 키웠고, 그것은 도와 도인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이어졌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속세를 떠나 깊은 산 속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스님을 속리산으로 이끌었다.
속리산(俗離山). 헌강왕 12년(886)에 속리산 묘덕암을 찾았던 고운 최치원은 산세를 보고 시를 읊었다.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데 사람은 도를 멀리 하려하고, 산은 세속을 여의지 않는데 세속인은 산을 여의려 하네(道不遠人人遠道, 山非離俗俗離山).” 구봉산이라 불렸던 산이 속세를 떠나는, 속리산이 된 유래다.
스님은 속리산을 찾아 은사인 혜정 스님(법주사 회주)에게 출가했다. 전기불도 없던 시절이었다. 현각 스님은 법당에서 태우다 남은 초를 가져다 생장작을 태우며 부엌데기 노릇으로 출가자의 길을 시작했다.
| |||
지적욕구를 채우기 위한 출가였기에 생장작을 타면서 피어난 연기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스님은 책을 보고 싶었다. 그런 공양간 살림을 하면서 스님이 생각한 묘수는 갱두 소임을 맡는 것이었다. 갱두는 국을 끓이는 소임이다. 불을 피우고 찌개를 끓이는 동안 스님은 장작불에 책을 읽으며 지식에 대한 갈증을 달랬다.
“도가 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있다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서 공부해서 깨쳐야겠다는 욕심만 가득했지요.”
당시 은사스님은 현각 스님에게 수행ㆍ포교ㆍ역경의 3대 종단사업을 말하며 “역경도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고, 포교ㆍ수행도 ‘배워야’ 바로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공양간 생활을 마치고 스님은 강원에 들어갔다. “이제는 하고 싶은 공부를 실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강원에서 처음 배우는 <치문>부터 막혔다. 어려운 글이 너무 많아 하루 2줄 밖에 읽지 못했다.
현각 스님의 머릿속은 “이래서 어느 세월에 ‘팔만대장경’을 다 읽을 수 있을까? 도를 이루면 오도송(悟道頌)을 쓴다는데 이렇게 무식해서야 어찌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찼다. 그래서 스님은 교학을 공부하겠다고 재발심했다. 오도송을 짓기 위한 도구를 마련하고자 시작했던 공부는 스님을 모교인 동국대에 남게 했다. 스님은 “‘업보중생’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봉직중이다. 20년이 넘는 세월에 학생시절까지 더하면 40여 년을 종립대학 동국인으로 살아왔다. 스님이 반백년에 가까운 세월을 동국대 교정에서 보내는 동안, 교정 곳곳 어느 곳 하나 스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다. 어느 나무가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지, 또 어떤 나무가 가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전령사가 되는지 등 스님은 동국대 곳곳을 ‘부처님 손바닥’처럼 보게 됐다.
학교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스님의 애교심도 남달랐다. 동국대 교내 법당인 정각원 원장 시절 부처님오신날 3000개의 연등을 교내에 장엄하고, 그 연등비를 후학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학자투, 대정부시위 등으로 최루탄이 매캐했던 교정은 정각원에서 설치한 연등으로 대학생들의 데이트 명소가 되기도 했다. 또, <정각도량>(당시 정각원보)을 창간해 동국대 구성원의 신행생활을 도왔다.
특히 학자로서는 국내에서는 생소했던 선학을 학문으로 체계화시켰다. 2000년 한국선학회를 창립해 선학의 저변확대와 신진학자의 등용문으로 활용했다. (한국선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선학>은 최근 학술진흥재단에 국내저명학술지로 등재되기도 했다.) 특히 스님의 대표저서인 <선학의 이해>는 선학전공자의 필독서일 뿐만 아니라 동국대 학생의 교양과목으로 매학기 강의가 이어지고 있다.
| |||
또, 스님은 학교 활동만으로는 광도중생의 출가 본분을 다함에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에 자아완성, 광도중생, 정법교화,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2004년 마니사에 마니불교아카데미를 세우고 <마니불교>를 펴내고 있다.
현각 스님은 “‘행하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조용히 있거나 하는 것 모두가 선(行住坐臥語默動靜)’이라는 말은 <증도가>, <석씨요람> 등 곳곳의 선적(禪籍)에서 보이고 있다”며 “여전히 ‘좌선만이 선’이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장사하는 재가자가 시장에서 내 물건을 사가라고 외치는 곳에 선이 없다면 불교는 생명력을 잃은 것이고, 불교의 생활화는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아온 스님의 가슴에는 어떤 구절이 담겨 있을까? 나그네의 물음에 돌아온 현각 스님의 답변은 놀랍게도 <초발심자경문>의 한 구절이었다.
고된 행자 생활 동안 다 헤져 너덜너덜한 책을 말 그대로 가슴에 품고 짬짬이 봤던 책에서 스님은 “삼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백년 탐낸 재물은 하루 아침의 티끌(三日修心千載寶 百年貪物一朝塵)”이라는 구절을 뽑아 수행의 근간이요, 평생의 지표로 삼아 왔다.
지적 호기심이 상당한 현각 스님이 이 구절을 택한 데에는 뭔가 더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제자인 나그네가 연이어 물었다. 왜 이 구절인지를.
구절 중의 단 한자, ‘재(載)’ 때문이었다. 스님은 “지금 와서 보면 쉬운 말이지만 당시로는 ‘재(載)’가 명쾌하게 해석이 안됐다. 경전을 구구단 외듯 하면서도 대부분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지만 ‘왜’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載)’는 당나라 때의 용어이다. 주나라 때는 연(年)으로, 하나라 때는 세(歲)로, 은나라 때는 사(祀)로 사용됐다”는 스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하늘 천(天)’으로 시작하는 천자문의 끝은 ‘야(也)’입니다. ‘이끼 야’라고 쓰여 있는 데 사실 이게 ‘입겻’의 오자입니다. 녹음기도 없던 시절에 발음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적다보니 오자가 생긴 것이에요.”
| |||
스님은 “학문도, 수행도 ‘왜’라는 의문이 없으면 출발이 어렵다. 의문이 이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광야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지루함에 빠져 중간에 좌절하고 만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불교(학)에서는 ‘왜’라는 의문만큼이나 믿음[信]의 초석을 쌓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信)은 범어로 ‘sradha(sra+dha)’이다. ‘sra’는 소리(voice, sound)이며, ‘dha’는 도달하다(reach)의 뜻을 갖고 있다. 대승불교의 출현으로 불상이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지게 된 것이다.
스님은 “‘소리에 도달한다’는 말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리에 이른다’는 말”이라며 “막연하게 산천초목 두두물물에 내 생각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리 즉 법에 당도하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이라 설명했다.
이어 현각 스님은 “부처님에게 기도하며 ‘돈ㆍ출세ㆍ건강ㆍ합격 등을 달라’며 거래하고, 이뤄지지 않으면 부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이는 믿음에 대한 개념이 잘못 선 것”이라며 “올바른 신행생활을 하려면 믿음에 대한 나침반부터 바로 놓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라는 직업 탓일까? 스님의 법문이 봇물처럼 끊이지 않고 터져 나왔다.
현각 스님은 “중생세계인 사바세계(sahaloka)는 ‘saha(싸우다)’+‘loka(세상)’, 싸우는 세상이고, 부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적멸의 세계”라며 “<금강경> 제18 일체동관분에서 ‘이소국토중 소유중생 약간종심 여래실지(爾所國土中 所有衆生 若干種心 如來悉知)’라고 한 것처럼 부처님(여래)은 세상 모든 중생의 가지가지 마음을 모두 알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부처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스님은 “처음 생긴 자[尺]는 자로 재서 만들 수 없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생교화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과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부처님께 올리는 최대의 공양은 그 가르침을 수지독송하고, 마음 속에 칠보로 장엄한 왕국을 세우고 항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널리 가르침을 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잠시 찻잔이 다시 오가고, 나그네의 시선은 창밖 설경을 향했다. 현각 스님은 “매일 산에 올랐는데 눈이 많이 와서 한동안 못다니고 있다”며 “인왕산에 오르며 자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여름 폭풍우에도 떨어지지 않고 나무를 키워야할 의무를 다한 파란 잎이 때가되면 노랗고 빨갛게 물들다 저절로 낙엽으로 진다”며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낙엽의 미덕이 있기에 겨울이면 나무는 설화를 피울 수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 “갈대의 속은 비었다. ‘비운다’면 잃어버린 상실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우나 실은 상생의 길이다. 속이 꽉 찬 나무는 겨울이면 쓰러져 설해목이 되기도 하지만, 텅 빈 갈대는 거센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고 서로를 지탱하며 상생의 지혜를 일러준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의 탐구심은 산행 중에도 끊이지 않았다. 산행으로 숨이 가빴던 스님은 ‘재앙(disaster)’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다.
스님은 “별(aster)이 자기 궤도에 충실하지 못하고 떨어져나간다면(dis) 우주에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중생들은 보이고 잡히고 들리는 것 모두를 갖고 싶어 마음을 헐떡거리며 살고 있지만, 자신의 본분(궤도)을 지키는 삶이 바른 삶이다. 헐떡이는 마음을 돌이키면 모두가 찬사의 대상이 되고 스승”이라고 강조했다.
| |||
<임제록>에는 ‘일기일회(一期一會, 일생의 단 한번 뿐인 인연)’라는 말이 있다. 스님은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뜻의 ‘일기일회’를 영어로 하면 ‘is now or never’”라며 “지금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바로 지금’ 주어진 매 순간을 감사해 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문이 끝났다. 아까 스님이 말했던 ‘보이지 않는 부처의 세계’는 정말 중생은 볼 수 없는 것일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나그네는 궁금했다.
현각 스님은 “서구에서 이상향을 뜻하는 유토피아(utopia)라는 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no place, no where)는 뜻이다. 하지만 w만 앞에 붙여 놓고 보면 ‘no where’는 ‘now here(지금 여기)’가 된다”며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적멸의 자리가 ‘지금 여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 여기(now here)’가 설해진 도량, 도심 속 진주처럼 아름다운 절 마니사가 바로 유토피아가 아닐까?
#현각 스님은 전북 정읍 출생. 혜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2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석ㆍ박사 과정 후 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각원장, 불교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선학회 초대 학회장과 美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센터 초청 연구교수 등을 지냈다. <선학의 이해> <선어록산책> <행복에 이르는 뗏목> <날마다 좋은 날>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