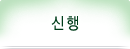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 ||||
“요즘 신문사는 어때? 거기도 힘들지? 세상에 힘들지 않은 곳이 있어야지. 그래도 신문사가 잘 돼야 하는데 말이야. 중요하거든. 세상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신문이 크게 북을 쳐서 정신을 이끌어주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사회도 문화도 바로 갈 수 있잖아.”
기자를 맞이했기 때문에 하는 첫인사 같지는 않았다. 햇살이 사각으로 들어오는 금둔사 태고선원 선방에서 인사를 올리자 정론직필도 양심적 지식인도 그리 많지 않은 세상을 염려하는 지허(智허 69) 스님.
“이 차 향기 한 번 맡아 봐. 내가 만든 건데,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덖은 거야.”
차(茶)에도 일가를 이룬 지허 스님은 선암사에 아홉 채의 전각으로 구성된 대규모 야생차체험관을 설립한 주역이기도 하다.
“나는 선지식이 아닌데 이렇게 먼 곳까지 왔으니 헛품을 팔게 되었네. 신문에 내고 말고는 기자선생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살아 온 이야기나 좀 들려 드릴까?”
스님 앞에 놓인 다탁은 찻잔 서너 개를 올려놓으면 딱 좋을 크기다. 가로는 세 뼘쯤 되어 보이고 세로가 한 뼘 반 남짓한 작은 다탁이다. 아무런 무늬도 없고 반듯한 사각의 다탁. 세 시간이 넘도록 계속된 스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다탁을 닮아 있었다. 꾸밈없고 크지도 않지만, 흐트러짐이 없고 여물기가 금강석 같은 반세기의 시간이 응축된 유적(幽寂)이었다.
벌교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남학생이 세 반, 여학생이 한 반 그렇게 네 반이 동급생이었지. 각 반에서 그래도 공부를 제일 잘 하는 사람 넷이 친했어. 그런데 서로 경쟁 관계니까 친한 속에도 은근히 서로를 경계하는 맘이 있었지. 그래서 서로 보는 앞에서는 짐짓 공부 하는 티를 안내려고 했지. 그래서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었는데 그게 죄다 서양의 철학서적 이었어. 칸트와 쇼펜하우어와 하이데거를 만난 우리는 자주 토론을 하기도 했고 각자가 골똘하게 인생을 생각하기도 했어. 그런데 그 서양의 철학자들을 접하고 나서 나는 조금씩 염세주의자가 된 거야. 나는 집안이 좀 부유한 편이고 형님과 누님들도 공부를 잘 하여 당시로서는 잘 풀렸지. 아버님께서 농사를 많이 지으시고 절을 하나 지을 정도로 불심도 깊으셨지. 그런 집안에서 내가 염세적으로 흐르는 것은 어울리지 않았지만, 나는 심각했어. 그 친구들과 수면제를 먹는 내기를 했는데, 참 부질없고 위험한 짓이었지. ‘세코날’이라고 들어 봤나? 바로 그 수면제였어. 친구 중의 하나가 그걸 50알을 먹고 죽은 거야. 종이에 없을 무(無)자 세 개를 써놓고.
| ||||
그 친구를 화장한 곳에 가 본 것은 이틀 뒤였어. 정말 아무것도 없더군. 만년필 꽂이 부분의 작은 쇳조각과 허리띠의 버클이 형체를 알아보겠더군. 그걸 보는 순간 ‘허무하고 허무하고 허무하다’ 그 없을 무자 세 개의 의미를 알게 되었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허무를 느끼는 나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후 친구들과 함께 순천 동화사란 절엘 갔는데, 거기서 청운(淸雲) 스님을 뵈었어. 그 스님은 송광사가 설립한 학교의 교사였는데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온 분이었지.
우릴 보고 먼저 물으셨어. “어디서 왔느냐?” “벌교에서 왔습니다.” “하늘을 보았느냐?” “봤습니다.” “본 것이 무엇이냐?” 그만 말이 막혀 버렸지. 벙어리처럼 서 있는 우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오가피 차를 한잔씩 주셨어. 그리고 다시 물으시더군. “마음을 아느냐?” “뭡니까?” “나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중이 되어서 참선을 하면 된다.”
나는 그 순간 내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 그게 중학교 3학년 가을의 일이야. 그해 겨울방학 때 나는 출가를 하려고 생각을 다지고 있는데 한 선배가 뜬금없이 찾아와서 “나 출가하는데 너도 가지 않을래?” 하더군. 뭐 생각할 겨를이 있나? 따라 나섰지. 그 형은 송광사로 가자고 했는데 나는 왠지 선암사가 좋을 것 같았어.
유복한 집안의 아들로 공부도 잘 했던 모범생에게 선암사의 행자 생활은 힘겨웠다. 그것도 겨울철에 절에 들어가 공양간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래도 행자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다. 염세의 그늘에 묻혀 있는 실존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 허무를 느끼고 하늘을 보았으되 바로 그 ‘느끼고 본 놈’을 알아야 했다. 그러기 전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행자 생활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갈망으로 몸을 축나게 했다. 결국 병이 나고 말았다. 두어 달을 앓다가 공으로 절밥 축내는 것이 송구스러울 무렵이었다. ‘길을 잘 못 들었나’ 하는 의심까지 찾아드는 어느 날, 칠전선원으로 불려갔다. 선암사 주지를 오래하고 당대 선객들 사이엔 이름이 높던 선곡(禪谷) 스님의 조치였다. 용성 스님의 법을 이은 선파 스님의 상좌인 선곡 스님은 6.25 전쟁 때 유일하게 남아 선암사를 지킨 분이다. 소개령이 내린 와중에 ‘나마저 절을 비우면 절은 다 불타버릴 것’이라며 끝까지 절을 버리지 않은 분이다. 상원사의 한암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지허 스님은 그 때가 참으로 행복했다고 회고 했다.
칠전선원에 올라가니까 노장 스님들이 10여 분 계셨어. 어린 나를 예뻐 해 주셔서인지 노장님들 모시는 것이 참 좋았지. 그런데 이 노장님들이 차를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다각(茶角) 소임을 맡은 나로서는 차 끓여 올리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어. 차가 나올 때는 그날 덖은 차를 그날 다 올려야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몸도 안정되고 일도 즐겁게 하던 어느 날 선곡 스님께 차를 갖다 드렸어. 스님이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시더군. “지용(智溶, 사미 때의 이름)아.” “네.” “세상에서 뭐가 제일 크냐?” “마음이 제일 큽니다.” 나는 나름대로 스님께서 법담을 하시는 줄 알고 아는 체를 좀 했는데, 스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 “마음이 크다? 하늘이 크지.” 나는 그 생각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 하늘이란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보이는 것이니 인식하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마음이 더 큰 것이란 생각이었지.
| ||||
그렇게 두 달이 지나고 다시 차를 갖다 드리고 자리에 앉아 여쭈었어. “분명 하늘 보다 마음이 더 큰데 그 큰 것을 모릅니다.” 스님은 아무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차만 드셨어. 차를 다 드시고 잔을 돌려주시면서 “내 차는 내가 마셨다”라고 하시는데 그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도 제 차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만법귀일(萬法歸一) 일귀하처(一歸何處). 이것이 네가 네 차를 마시는 도리다.” 나는 그렇게 선곡 스님에게 화두를 받은 거야.
이후 지허 스님은 강원에 들어가 경을 배웠다. 열심히 공부했다. 어려운 시절, 공부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절집의 시절인연이었다. 선곡 스님이 편지 한 장과 함께 해인사로 가라고 하여 해인사 용탑에서 고암 스님을 2년여 시봉했다.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께 대들었던 지허 스님의 회고담이 귓전을 떠나지 않는다.
한 때, 용성 스님께서 제방 선원에 “안수정등(岸樹井藤)의 일구(一句)를 일러라” 하는 전갈을 내니까 만공 스님이 “작야몽중사(昨夜夢中事)니라” 라고 답했고 보월 스님은 “불불(佛佛)이 불상견(不相見)이라”고 답했지. 용성 스님은 스스로 답하기를 “표화(瓢花)가 철리출(?裏出) 하니 와재마상전(臥在麻上田)이라[박꽃이 울안에 피니 삼밭위에 드러누었도다]”고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
극락암에서 내가 경봉 스님에게 “저도 한 번 일러 볼까요?” 했더니 스님께서 물으셨어. “안수정등의 일구를 일러라.” “남산화(南山花) 북산홍(北山紅)입니다.” “철저하지 못하다.” “어찌하면 철저하겠습니까?” “정진 또 정진하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방을 나오는데 뒤에서 경봉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어. “용성 스님이 안 계시는 게 한이로다.”
나는 순간 우쭐해지려는 마음을 고쳐먹고 정진 또 정진하라는 경책을 뼈에 새겼지. 그리고 더 이상 떠돌지 않으리란 생각에 고향과도 같은 선암사로 다시 돌아왔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비로암 터에 토굴을 짓고 혼자 정진을 했는데 왜 그렇게 즐겁고 힘이 나던지. 나는 선곡 스님에게 받은 ‘만법귀일 일귀하처’ 화두를 들고 몽매일여가 되도록 정진을 했어. 즐거웠지.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구름이 흘러가는 모양도 다 즐거움 그 자체였지. 그러던 어느 날 산비탈에서 나무를 하고 오는 길에 지게 목발이 뭣에 걸려서 지게를 진채로 20여 바퀴를 굴렀어. 순식간에 넘어져 마구 굴러 내려가다가 일어섰는데, 아차 싶더라고. 일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넘어져 구르는 동안에 그만 내게서 화두가 달아나고 없었던 것이야.
지허 스님은 심각했다. 나름대로 제방을 다니고 보고 듣고 느낀바 있어 홀로 토굴을 짓고 정진을 했는데, 그래서 몽중일여의 즐거운 나날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동안 남의 옷을 걸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나무하는 일도 팽개치고 지독하게 정진했다. 죽음의 관문을 넘어 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다. 어느 날 방문을 열고 나가다가 기러기 떼가 ‘끼욱 끼욱’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 것을 보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는가 싶더니 천지가 무너졌다. 마당에 내려서서 작대기로 땅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적었다.
천심비로화개홍(千深毘盧花開紅)
만리장천안성백(萬里長天雁聲白)
용로중출청량월(鎔爐中出淸凉月)
삼라상두무영인(森羅相頭無影印)
비로암은 천길 깊은데 꽃 피어 붉고
끝없는 하늘가 맑디맑은 기러기 소리여.
용광로 속에서 밝은 달뜨니
삼라만상 머리마다 그림자 없는 도장 찍었도다.
그해 가을 지허 스님은 산길을 넘어 송광사 삼일암을 찾아 갔다. 삼일암에는 방장 구산 스님이 계셨다. 작대기로 문을 두드리니 시자가 나왔다. 방장 스님 친견을 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큰스님을 모시는 시자에게 남루한 옷에 초췌한 얼굴, 작대기 하나 끌고 온 객승이 탐탁찮은 거야 당연지사. “시자님, 지금 보이는 내 모습을 그대로 방장 스님에게 일러 주시오.” 결국 방으로 불러들이신 방장 구산 스님이 물으셨다. “어디서 왔는고?” “조계산 양지에서 왔습니다.” “선암사인가?” “아닙니다. 양지에서 왔습니다.” “뭐하고 사느냐?” “비로암에 삽니다.” “침굉 스님 사시던 곳?” “그렇습니다.” “화두는 있느냐?” “만법귀일 일귀하처입니다.” “낙처(落處)를 아느냐?” “한 번 물어 주십시오.” “무엇이 만법귀일 일귀하처인고?” “동쪽 처녀가 서쪽 오랑캐를 업고 갑니다.” “아니다. 다시 일러라.” “서쪽오랑캐가 동쪽 처녀 등에 업혀 갑니다.” “더 없는가?” “망상이 한 구절 생겼으나 떨쳐 버렸습니다. 한 번 써 보겠습니다.” 지허 스님은 비로암 마당에 썼던 글귀를 써 보여 드렸다. 그리고 그간의 살림살이를 말씀드렸다. 구산 스님이 가까이 앉으라 하시더니 손을 잡고 문 밖을 내다보시며 “저기 감이 한창이네” 하셨다. 지허 스님이 바로 받았다. “감이 어떻습니까?” “붉은 감도 떨어지고 선감도 떨어지네.” “선감도 먹고 붉은 감도 먹습니다.”
그날 밤 구산 스님은 지허 스님을 옆에서 자라고 했다. 자정이 가까워서 잠자리에 누운 것인데 한시각이 지났을 무렵 구산 스님이 ‘어험!’ 하고 기침 소리를 내셨다. 지허 스님도 ‘어험!’ 했다. 침묵. 한 시각 쯤 다시 지나고 구산 스님이 ‘어험!’ 하시고 지허 스님도 ‘어험!’ 했다. 한 시각 쯤 있다가 구산 스님이 일어 나셨고 지허 스님도 따라 일어났다. “잘 잤느냐?” “삼일암 잠이 이렇게 꿀같이 단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침 인사를 나눴다. 비로암으로 넘어 온 뒤 구산 스님은 가끔 지허 스님에게 먹을 것과 약을 보내기도 하셨다. 그러나 구산 스님이 입멸에 들었을 때는 문상을 하지 못했다. 선암사 대중이 오해를 사기 싫어서였다. 조계종과 태고종 분규의 정점에 있는 선암사의 현실이었다. 지허 스님은 그러한 선암사에서 주지를 12년 했다. 중창불사와 가람수호의 세월은 지허 스님에게 또 다른 ‘사관(死關)''이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많은 불사 가운데 조사전 건립불사를 중요하게 여긴다. 중국의 달마 이래 육조를 거쳐 이어 온 선맥이 석옥청공을 거쳐 한국의 태고 보우로 이어지고 선암사 침굉선사로 흘러 온 선맥을 밝혀 둔 것이다.
이젠 다 놓았어. 공부하러 절에 와서 절일만 하느라 시간 다 가고 인생을 조저부렀지 뭣인가. 나는 그래도 세 가지는 잘 해. 나무 잘하고 빨래 잘하고 그리고 돌담을 잘 쌓지. 태고선원은 반농반선이 원칙이야. 일 하지 않고 공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하여 인류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모두 행복한가? 이제 신농경사회로 가야해. 변혁을 하지 않으면 발전 못하고 잘 살 수도 없어. 신농경사회란 오염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지. 절이 먼저 솔선해야 해. 절이야 말로 자연과 함께 인간의 참 성품 깨우치면서 살 길을 인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잖아. 차 농사를 지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 결국 불교가 해야 해. 인류를 자연으로 되돌리는 일을 말이야. 그러고 보니 내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군. 그만 할까?
금둔사 태고선원 뒤란에 섣달에 피는 납월매(納月梅)가 열 댓 송이 피어 붉은 향기를 흩뿌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