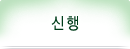고려대장경을 모셔 놓은 장경판전 앞에 섰다. 살틈에 눈을 가까이 들이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팔만여장이나 되는 경판이 판가(板架)에 차곡차곡 쌓여진 것이 눈에 들어온다. 팔만여장의 경판들은 삼년동안 바닷물에 담가두었던 산벚나무로 만들어졌다. 서른 명 남짓한 사람들이 일배(一拜)하고 경판에 글자 한자 새기고 또 일배하고 한자씩 새겨나가기를 반복하여 새겨진 글자의 수가 오천이백만자에 이르며, 걸린 세월은 무려 십육 년이나 된다. 그들의 정성이 하늘과 땅에 맞닿았고 그들의 염원이 하늘과 땅에 사무쳐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던 나라를 구한 것이다. 13세기에 제작되어진 고려대장경은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여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장경판전 옆 2평 남짓한 조그만 방에 머무시면서 오직 판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생각하는 스님 한 분이 계시니 바로 관후 스님이다. 관후 스님은 자신의 법명대신 직책인 ‘장주 스님’으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다른 이들도 또한 그렇게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장주 스님은 여덟 살에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갑사로 간 것이 바로 출가의 길이 되어버렸다. 할머니는 부모를 일찍 여읜 박복한 손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행상으로 근근이 끼니를 이어가는 할머니로서는 무엇 하나 풍족하게 해 줄 수가 없었다. ‘손자를 절에 팔면 더 잘 될 것’이라는 주지스님의 말에 할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갑사에 맡겼다. 낯선 곳에 혼자 두고 간 할머니가 밉고 원망스러워 어린 손자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가난한 속가 집을 떠나 갑사로 왔지만 배고픔은 여전하였다. 그래도 갑사에서 열일곱까지 십년 가까이 행자생활을 하였으니, 스님의 심전(心田)이 어지간히도 무던했나 보다.
갑사에는 장주 스님을 포함한 동자승이 아홉 명 있었는데, 아침저녁으로는 죽을 쑤어먹고 점심 한 끼만 밥을 먹었다. “죽을 푸고 난 솥에 아홉 명이 달라붙어 손가락으로 훑어먹다 보면 솥을 씻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해졌다”고 그 시절을 회상하는 스님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다. “나는 그때 이미 중노릇 다한 것이라 생각해요. 그때 중노릇을 잘한 까닭에 내가 이렇게 장경판전을 지키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완물상지(玩物喪志)라, 이젠 시절이 바뀌어 물질이 인간을 희롱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 장주 스님은 무엇 하나 귀한 줄 모르고 풍족하게 사는 요즈음의 세대들에게 본보기가 좀 되라 싶어 색이 바래고 낡은 가사장삼을 입고 있다. 여기 저기 누덕누덕 기운 장주 스님의 가사장삼을 보니 부처님 당시의 일화 한편이 떠오른다.
우전왕의 왕비가 5백 벌의 가사를 아난존자에게 보시했다. 그때 왕은 아난존자에게 “이 많은 옷을 다 어떻게 하시렵니까?”하고 물었다. 아난존자가 “여러 스님께 나누어 드릴 것”이라 답하자, 왕은 “그러면 그 입던 옷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또 다시 물었다. 그에 대한 아난존자의 대답은 이러하다. “입던 헌 옷으로 이불덮개를 만들고, 헌 이불덮개로는 베갯잇을 만들 것이며, 헌 베갯잇은 방석을 만드는데 사용할 것이며, 헌 방석은 발수건으로 쓸 것입니다. 그리고 헌 발수건은 걸레로 만들 것이며, 헌 걸레는 잘게 썰어 진흙과 섞어서 벽을 바르는데 쓰겠습니다.”
출가자들은 보시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검박한 생활을 해야 만이 대중들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라는 것이 장주 스님의 생각이다. 누구보다도 탁발을 많이 했던 스님은 “탁발을 해보아야 입안에 들어가는 쌀 한 톨 과일 한 조각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 수 있으며,인욕바라밀을 배우고 증진시키는 방편으로는 탁발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한다.
1986년에 해인사 장경판전의 장주 소임을 맡았으니 그 세월을 헤아려보니 스무 해도 훨씬 넘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처님 전에 새벽 예불과 함께 백팔참회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열고, 저녁 예불 후 장경판전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으로 일과를 마무리 한다. 장경판전을 지키는 소임이 어떤 소임보다도 그 책임이 지중한 것임을 알기에 장경판전의 열쇠가 스님의 몸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장경판전을 열 일이 있으면 직접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 모셔진 경판이 팔만장이나 되지만, 한 글자도 잘못 쓰거나 빠뜨린 글자 없이 완벽해요. 그리고 경판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똑같아요. 경판을 보면 환희심이 절로 나지. 판전을 지을 때 땅 밑에 숯과 소금을 몇 층으로 넣어놓았기 때문에 벌레가 꾀지 않고 습기가 차지 않아요.”
판전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통풍도 잘 되고, 실내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등 지금 현대 과학을 총 동원하여 새로 짓는다 해도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고 한다. 장경판전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시는 스님의 얼굴과 목소리에는 어느덧 자부심으로 가득 차있다.
“일본학생들도 이곳을 많이 방문해요. 일본학생들은 가이드나 선생님의 말을 열심히 듣고 그것을 수첩에 일일이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지도 않고 장난치는 것이 다반사(茶飯事)라 속상할 때가 많아요. 전 한국의 엄마들이 아이들을 망친다고 생각해요. 학교 공부만을 제일로 치고 이런 문화재나 역사 공부는 소홀히 하니 큰일 아닙니까?”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는 경판은 770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지만, 목재의 최대 수명이 천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장주 스님은 요즈음 걱정이다. 지금은 법보전 등 일부는 오픈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발자국과 훈김조차도 목판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에 앞으로는 장경판전 전체를 폐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장주 스님은 얼마 전 백내장 수술을 하였는데, 아직 회복이 끝나지 않았는지 침침하게 보인다면서 육신의 노쇠함이야말로 피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한다. 육신의 노쇠야 그닥 중요하지 않는데, 금생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단다.
“세상의 온갖 호사스런 부귀영화도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과 슬픔도 언젠가는 끝이 있으며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도 같아요. 그러니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고통 속에서 산다고 해서 절망에 빠질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머물지 않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때가 바로 공부할 때임을 알아차려야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장주 스님은 “그래도 전생에 반푼어치의 복이라도 지었기에 불제자로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활짝 웃으신다. 거기다 또 반푼어치의 복을 보탠다면 수십 년을 장경판전의 장주소임을 맡은 것이라 하니 관후 스님은 하늘의 소명을 받잡고 온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후 스님은
갑사에서 혜안스님을 은사로 혜안스님으로부터 사미계수지. 1969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86년 해인사 장경판전 장주 소임을 맡아 오늘날까지 이십년 넘게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