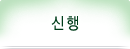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 |||
35년 동안 가꾸었던 인취사를 나와 예산의 한 과수원 옆에 청화재(靑華齋)라는 이름의 연꽃 도량을 가꾼 지 3년째다. 1000여개의 고무 통에서 백련들이 숨을 쉬고 있고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방금 눈을 뜬 수련들이 수줍게 웃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 3개를 절묘하게 연결해 지은 청화재는 농막(農幕) 같기도 하지만 정갈하고 우치 있는 도량이다.
“이거 읽어 봐.”
인사를 드리자마자 종이를 내미신다. A4 용지 두 장. ‘삼족까마귀’란 제목의 시다. 찬찬히 읽고 있는 동안 스님은 차를 다라 주신다. 사발 크기만 한 찻잔에 연꽃향이 가득하다. 백련차다.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작년 가을 집안(集安)을 중심으로 고구려 유적들을 좀 보고 왔지.”
“웅혼하던 기상이 스러져 버린 곳을 둘러보신 애절함이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 민족이 할 일이 많고 불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해. 그런데 지금 하는 짓들을 봐. 이래가지고 민족의 미래가 있을 것 같아?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정치는 쌈박질로 바쁘고 종교인은 ‘면죄부’ 장사하기에 바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뒤틀리고 사라지고….”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개탄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다. 물론 스님의 개탄은 비판을 위한 비판도 무작정의 비난도 아니다. 우리 민족이 가야할 바른 길, 불자들이 지녀야 할 바른 정신을 촉구하는 사자후다.
| |||
혜민 스님이 제시하는 정신정화의 요지는 ‘둘이 아닌 도리’를 아는 것이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알고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스님은 “깨달음의 삶에 있어서 지식은 윤활유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화엄경>의 가르침이 결국은 대립과 갈등을 다 극복하고 하나의 도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신정화를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대립과 상실과 왜곡의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혜롭게 원융과 조화의 삶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강조하는 역사와 문화의 상실과 왜곡은 우리의 상고사를 잃어버린 것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작년 가을 집안의 고구려 유적을 답사하며 커다란 비감(悲感)에 싸일 수밖에 없었다. 민족의 뿌리를 제대로 추스르지 않고 어떻게 올바른 문화가 형성되고 유지되겠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불교문화는 전래 이후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중요한 맥박인데,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세상을 밝히고 이끌어 가는 횃불과 견인차 역할을 못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매년 추사(秋史) 김정희 선생의 탄신일과 기일에 제사를 모시고 있는 혜민 스님은 “추사체는 없다”고 말한다.
“중국의 왕희지가 역사에 둘도 없는 대목(大木)이라면, 추사는 연장 없는 목수입니다. 추사체라는 것은 없어요. 갈이지(之)자 하나도 같은 서체가 없는 것이 추사 선생님의 글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체’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 유배 시절을 유마처럼 사셨고 북청 유배시절은 화엄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이미 선생님의 글씨는 세상의 격식과 인식을 벗어나 대자유의 경지를 훨훨 날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추사체라는 이름으로 묶어 두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혜민 스님은 ‘배달민족’이란 ‘이 땅에서 모성을 근본으로 하는 영원히 밝은 민족’이라고 풀이하며 화엄의 가르침대로 본래 둘이 아닌 하나의 장엄한 민족으로서의 기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사의 글씨처럼 말이다.
| |||
우리 시대의 ‘숨은 명필’ 가운데 한 분인 혜민 스님은 백련을 통해 법향을 퍼뜨린 것처럼 메발톱꽃을 통해 불교의 정신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정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불자들이 먼저 정신정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사무치게 강조하는 혜민 스님. 오늘도 스님은 세상을 향해 묻는다.
“인간세상 보다 더 밝고 환한 ‘화엄’이 어디 있겠는가?”
| 혜민 스님은 | ||||||||||
|
| 삼족까마귀 |
|
세월을 넘어 오녀산성(五女山城)을 둘러 보았다. 목이 말라 옛 우물을 찾았다. 이끼에 둘러싸인 우물은 파란 하늘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고구려 첫 번째 도읍인 이곳 환인(桓仁) 그 장엄했던 대륙의 발자국을 더듬으며 구름 사이로 지워져 버린 역사를 그리고 있었다. 나는 목마름도 잊어버린채 장엄한 그 환영 앞에서 넋을 잃고 있었다. 광풍이 몰아치는 오녀산성을 맴도는 삼족 까마귀 태양을 상징하는 그리고 역사와 꿈을 먹고 산다는 우리 민족의 혼 삼족까마귀 아무도 찾는 이 없는 허허한 산성 부러진 화살 꽂혀 있는 낡은 둥지를 아직도 맴돌고 있다. 지평선 넘어 어딘가에서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면 요동벌을 호령하는 고구려 병사들의 함성이 들려오면 삼족까마귀는 잃어 버린 언어를 다시 찾겠지 아! 목이 마르다. 해란강 물을 다 마셔도 목이 마르다. 압록강 두만강 물을 다 마셔도 갈증은 가시지 않는다. 가슴이 답답하고 더욱 목이 메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