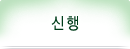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 |||
명정 스님의 방. 스님은 다관 가득 차를 붓는다. 보통의 경우라면, 십 수번은 족히 우려먹을 수 있는 양이다. 찻잔에 차를 따르더니 찻잔을 든다. 잔을 부딪치며 하시는 말씀. “건배!” 방안에 웃음이 한바탕 인다. 주욱 들이키고 잔을 내려놓으며 이어지는 말씀. “누가 탔는지 맛 조오타!”
극락암 호국선원 선원장. 근대를 대표하는 선지식인 경봉 스님을 시봉했고, 선방에서의 정진에도 치열했던 명정 스님. 경봉 스님의 문집은 물론 경허집, 신신명 등 여러 권의 책을 펴낸 명정 스님에게 사람들은 근엄하고 심각한 모습을 기대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갈 때가 많다.
“일생을 통해 스승을 만난 행복이 클 것 같다”며 스승 경봉 스님과의 일화를 청하자 대뜸 새끼손가락을 펴 보이며 “난 이거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은데. 이거 만난 얘기라야 짜릿짜릿했다 어쩌구저쩌구 할 말이 많을 텐데….”라며 짐짓 심각한 표정이다. 새끼손가락은 애인을 말함이다.
| |||
“어떤 사람들이 내가 차 우리는 것을 보고 집에 가서 그대로 했는데 그 맛이 안 난다고 해. 똑 같은 양의 차를 넣고 물 온도도 스님이 하는 그대로 했는데 그 맛이 안나요 그러는데, 우습지. 하루 이틀에 그 맛이 나는 게 아니지.”
스님에게 차를 우리는 일은 스승 경봉 스님에게서 받은 화두만큼이나 지중한 수행방편이었고 수행의 열매 그 자체였다. ‘한 잔의 차에 선가(禪家)의 살림살이가 모두 들었다’는 말을 빌지 않더라도 출가 이후 지금까지 차를 우리며 그 안에서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명정 스님의 차 맛이 나왔다.
막신일호(莫神一好). 하나를 좋아해서 미치고 통달하는 것보다 더 신명나고 완전한 것은 없다는 순자의 말이다. 그것은 명정 스님이 허리춤에 차고 다닐만한 금언이라고 여기는 말이다. ‘하나를 좋아하는 것’ 그 하나를 만나는 일이 어디 쉬우랴? 스님에게 그 하나는 자기 존재에 파고드는 일이었고 근본 바탕을 찾는 그 ‘하나’속에 치열한 선방 수행도, 스승을 모시며 차를 우리는 일도 모두 들어 있었다. ‘하나를 좋아해서 미치고 달통하는 것’ 그것이 스님의 일상이었다.
| |||
“내 책상 앞이 둘러 꺼졌어. 의자에 앉아 꽤나 끙끙거렸나봐.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해야 하나, 끙~ 이게 무슨 뜻인고, 끙~” 스님의 책상 앞 의자가 놓였던 자리가 정말로 패여 있다. 스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책상머리에 앉아 씨름했을지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 “한문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통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 간만에 진지한 고백을 한다.
“선문에 이런 말이 있어. 원앙수출종군간(鴛鴦繡出從君看) 막파금침도여인(莫把金針與渡人). 원앙새를 수놓아 보일지언정 바늘이야 주지 말게나. 원앙새를 수놓는 것이 일호(一好)의 끝경지야. 그런데 그 일호는 자기가 미치고 환장해서 헤매고 땀 흘리며 찾는 보물이지 바늘을 챙겨 준다고 수놓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 바늘을 줘봐야 쓸데가 없는 거지.”
명정 스님이 공부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는데요~”라며 영구 어투를 흉내 내는 이유는 바로 바늘을 건네 봐야 쓸모가 없다는 말일게다. 하나에 미쳐 한곳으로 깊이깊이 푹 빠져버릴 수 있는 마음속의 불씨는 스스로 지펴야지 어디 가서 물을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 |||
현재 호국선원에는 큰방에서 21명, 후원에서 10여명이 정진 중이다. 대중들에게 엄하냐는 질문을 하자 대답대신 이런 얘기를 들려준다. “송광사에서 입승보던 스님이 소임 맡아 놓고 가버려서 내가 소임 사는데, 통광 스님이 나한테 애들한테 잔소리 지나치게 한다고 그래. 그때만 해도 성질이 눈에 안 맞으면 어쩌구저쩌구 그랬나봐. 지금은 배를 끌고 산으로 가도 그런 일도 있구나 해.” 후학들을 대하는 스님의 일상을 짐작케 한다.
스님에게 스승 경봉 스님은 일생을 바꿔놓은 둘도 없는 ‘애인’ 이었다. 스승과의 첫 만남을 얘기하기 위해 스님은 1959년 10월 24일 해인사로 출가했던 날의 얘기부터 꺼냈다. 스님식으로 표현하자면 ‘어쩌구저쩌구’의 사연이 풀려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출가할 당시에 금봉 스님, 고봉 스님, 효봉 스님, 경봉 스님 등 ‘봉’자 돌림 스님이 10여명이 계셨어. 수좌들끼리 수군수군하는 소리 들으니 봉이 십봉이 넘었는데 어디로 갈까?하는 거야. 함께 공부하던 스님의 말을 듣고 해제 며칠 뒤에 조그만 괴나리봇짐하고 이불 싸들고 도망치듯 해인사를 나와 경봉 스님을 찾아 통도사로 향했지.”
커다란 봉우리를 찾아 떠나온 길의 끝에 극락암이 있었다. 고속버스가 없던 시절, 그렇게 스님은 물금 가는 버스를 타고 물금에서 내려 포교당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양산까지 20리를 꼬박 걸어야 했다. 다시 양산에서 신평까지,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없이 이어진 극락암까지 가는 길을 걷고 또 길었다. ‘노장님 만나러 온 거니까’하며 일심으로 또박또박 걸어와서 마주한 극락암.
| |||
입영통지서가 나오기까지 5년 동안 시봉했다. 입영 직전까지 49재 준비를 말끔히 마쳐놓고 스님께 “스님 다녀오겠습니다”하고 인사를 드리니 “너 정말 갈래?” 하셨다고 한다. “아, 글쎄 군대가 정말 가고 가짜로 가고 그러나? 노장님이 그 당시 돈으로 500원을 주셨어. 그 돈으로 PX가서 빵 사먹고 그랬어.”
군대에서 고생한 얘기들이 이어진다. 얘기 중간 중간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똑똑히 기억해”라는 말과 함께 날짜와 이름들을 정확히 읊조린다. 스님의 놀라운 기억력에 얽힌 얘기가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교과서에 나오는 심청전을 읽어보라는 선생님의 말에 책도 보지 않고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외워버려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일부러 외운 게 아니고 재미있어 두 번 정도 읽은 게 전부였다. 스님의 이 같은 기억력은 스승인 경봉 스님의 법문 기억에도 여지없이 발휘돼 6개월이 지난 경봉 스님의 법문까지 한자도 안 빠지고 기억했을 정도였다.
| |||
스승의 유품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명정 스님은 조만간 극락암에 유물관을 지을 예정이다. 스승 경봉 스님의 친필들과 한암 스님, 용성 스님, 춘성 스님, 운봉 스님, 설봉 스님, 벽암 스님, 용성 스님, 운허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과 주고받았던 편지글 등을 일반에 선보이기 위해서다.
여름과 가을의 뚜렷한 경계는 없지만 계절은 분명 오간다. 어느 날 문득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을바람이 선들 불어오고 아, 가을이구나 하고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 통도사 극락암에서 명정 스님을 만나 뵙고 돌아온 다음 날, 분명 한여름임에도 문득 가을을 느꼈다. 청량한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흔드는 순간의 느낌, 혹은 스님의 방에서 차를 넘긴 뒤 입안에 고였던 달콤함의 맛 같은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때 아닌 ‘가을’이 불쑥 찾아왔다. 스님이 우려낸 한 잔의 차를 마셔본 사람이라면 이 ‘가을’ 느낌을 짐작할지도 모를 일이다.
1943년 김포에서 태어난 명정 스님은 59년 해인사로 출가했고 1961년 경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65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60년부터 82년까지 경봉 스님을 시봉했으며 70년대 후반이후 극락암에서 머물며 경봉 스님의 법문집 <경봉스님 말씀> 큰스님들의 서간문을 엮은 <삼소굴 소식>을 비롯 <차 이야기 선 이야기> 등을 펴냈다. 경봉 스님 사진첩 발간 준비를 거의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