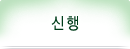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 ||||
“이 자리에 앉아 깨닫기 전에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다짐한 것처럼 안거든 납자들도 좌복위에 앉는 순간 생사를 초월하는 화두 투과를 다짐한다.
공주 계룡산 장군봉 제석골에 자리잡은 학림사(鶴林寺) 오등선원(五燈禪院). 숲에 깃든 새들처럼 깨달음을 향한 일념으로 대원 스님(학림사 조실)의 회상에 좌복을 편 납자는 열 네명.
동안거에 들며 첫 한달을 24시간 눕지 않고 참선하는 장좌불와(長坐不臥) 용맹정진을 했다. 안거 막바지인 요즘은 하루 18시간씩 참선수행을 하는 가행정진(加行精進)을 하고 있다. 저마다의 화두는 계룡산 골짜기 소나무 보다 성성하다.
개원한지 20여년. 공간이 넓지 않아 다소 불편한 오등선원이지만 안거철마다 일대사를 해결하고자 모이는 납자들의 방부는 끝이 없다.
대원 스님이 백척간두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수행에 출재가의 구분이 있겠는가. 선원의 윗 층(상선)은 스님들이 아래층(하선)은 재가선객들이 화두를 타파하기 위한 정진에 여념이 없다. 대원 스님 역시“기한(飢寒)에 발도심(發道心)(배고프고 추운 데서 도 닦을 마음이 우러난다)”이라며 눈꼽만큼의 인정도 용납하지 않는다.
올 동안거는 서른 명이 방부를 드렸지만 절반이 ‘중도 탈락’하고, 현재 남은 납자가 열 네명인 것 만 봐도 오등선원의 정진이 얼마나 혹독한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오등선원의 선방을 엿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 그러나 2월 6일 이례적으로 아주 잠깐 문을 열어 주었다. 사람이 죽어도 그대로 두었다가 해제가 되어서야 다비식을 거행할 만큼 엄한 것이 선방(禪房)의 규율이니 잠깐의 취재는 ‘가피’였다.
낮 12시 40분. 점심공양을 마치고 수행중 근육의 경련을 막기 위해 뒷산으로 포행을 떠났던 납자들이 선방으로 모여든다. 덕지덕지 기워진 승복을 입은 스님들의 모습 그 자체로 선기가 느껴진다. 스님들의 눈은 광채로 빛나 마주 볼 수가 없다. 납자들은 보시함, 바느질함, 욕주함, 다리미함, 상비약함, 서시함이 있는 대중방에서 요가를 하며 잠시 몸을 풀더니, 둘러앉아 간단한 대중공사를 했다. 그런 다음 선방으로 들어갔다. 포행도 운동도 대중공사도 다 수행이었다. 물 흐르듯 조용히 바깥경계를 다스리는 찰나찰나가 수행이었다.
선방 풍경이 눈에 들어 왔다. 가운데 작은 부처님상이 모셔져 있고, 한쪽 벽면에는 용상방(龍象榜)이 붙어 있다. 수행자를 물에서 으뜸인 용과 뭍에서 으뜸인 코끼리에 비유해 납자들의 소임과 법명을 적은 것이 용상방이다. 그 밑에는 가사가 줄지어 벽에 걸려 있다.
납자들이 좌복을 펴고 자세를 잡자 입승 스님의 죽비소리가‘딱 딱 딱’방안을 채운다. 정적이 감돈다. 오직 바람소리와 수각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뿐이다.
납자들은 천길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딛는 구도심으로 ‘한 소식’을 얻기 위해 또 그렇게 ‘새벽 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행정진의 일과는 단순하다. 아침 6시 공양을 한 뒤 8시에 선방에 들어가 11시에 나온다. 점심공양을 한 뒤 오후 1시에 들어가 5시에 나온다. 또 저녁 공양 후 저녁 7시에 들어가 새날 아침 6시에 나온다. 더도 덜도 없다. 오직 화두만 있을뿐이다.
납자들을 경책하는 대원 스님의 가르침은 발심의 묘약이다. 스님은 납자들이 한철 농사를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시로 공부를 점검한다. 매일 새벽 3시면 법상에 올라 줄탁동시(拙啄同時, 병아리가 알에서 날 때에 어미닭이 알을 쪼아 돕는 것)의 소참법문도 빼놓지 않는다. 한달간의 장좌불와로 시작한 오등선원의 동안거. 정월 보름날이 오면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눈을 마주쳤던 ‘새벽 별’에 눈맞춘 납자들이 세상을 향해 오도송을 토해 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