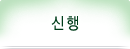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 |||
“<임제록>에서 불법의 분명한 대의는 무엇인가?”
“임제(臨濟義玄: ?∼867) 스님이 황벽 스님에게 세 번 묻고 세 번 맞은 것(三度發問 三度被打)이다.”
1월 30일, 서울 옥수동 미타사 대승암 대웅전에서는 쌀쌀한 날씨에도 법랍 20년 이상의 비구, 비구니 스님 70여명이 조계종 전 교육원장 무비 스님의 <임제록> 강의를 숨죽이며 경청하고 있었다. 조계종의 제1교과서이자 소의어록임에도 그 어느 곳에서도 듣기 어려운 <임제록> 강좌가 모처럼 열린 탓인지, 법문을 설하고 듣는 모든 대중이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다.
무비 스님은 “지난 해 벽송사 선회(禪會)가 종단의 관심 속에 공부 열기를 불러일으킨데 이어, 불교경전연구회(회장 지장)가 <임제록> 강좌를 개설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선교일치(禪敎一致)의 수행풍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스님은 이번 강좌가 1978년 탄허 스님의 ‘<화엄경> 강좌’로 시작된 공부 열기가 관응 스님의 ‘유식 강좌’와 ‘<선문염송> 강좌’로 붐을 이어갔다고 회상했다. 이어 명심회, 화엄회, 경학원, 불교경전연구회 등이 꾸준히 실참과 교학을 함께 공부해 온 연장선에서 이번 강좌가 열린데 대해 무척 고무된 표정이었다.
| |||
무비 스님은 “오래된 사찰의 비석에는 거의 임제의 몇 대 후손이라고 적혀 있으며, 다비식 때의 축원에 ‘빨리 이 땅에 돌아오시어 임제 문중에서 길이 인천의 안목이 되어주소서(臨濟門中 永作人天之眼目)’라는 축원이 들어갈 정도로 임제사상이 한국 불교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임제록> 강의는 1971년 서옹 스님의 봉암사 강의 이후 스님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드물 정도였다. 아마도 <임제록>을 강의하려면 서옹, 성철 스님과 같은 안목과 수행경지를 갖춰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이번 강의에서 무비 스님은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살림살이를 자신있게 드러내려는 의욕에 차 있었다. 스님은 본문에 앞서 ‘행록(行錄: 행장)’을 강설하면서 임제 스님이 무엇을 어떻게 깨달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무엇이 불법의 분명한 대의입니까?”
이런 질문을 황벽 스님에게 던진 임제 스님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무려 20방망이를 두들겨 맞았다. 이어 두 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지만, 똑같이 몽둥이가 날아왔다. 세 번 묻고 세 번 얻어맞는 동안, 무려 60방망이를 맞은 것이다. 그렇다면 ‘세 번 묻고 세 번 맞은 것’이 어떻게 불법의 대의란 말인가? 무비 스님은 이렇게 사족(蛇足)을 달았다.
| |||
“불법의 대의를 묻는 말에 무려 60방망이나 맞았으니, 불법치고는 ‘청전백일에 날벼락(白日靑天霹靂威: 임제 가풍을 상징한 말)’ 같은 기상천외의 불법이다. 하지만 황벽 스님은 자신의 불법에 대해 소신껏 보여주었다. 임제 스님의 묻는 행위 자체가 이미 답을 내포하고 있지만, 황벽 스님은 더욱 강하게 때리는 행위를 통해 불법의 대의를 드러낸 것이다. 불법의 대의란 때리고 맞는 그 사실이다. 즉 대기대용(大機大用)이며 전체작용(全體作用)이다.”
무비 스님은 임제 스님이 ‘세 번 묻고 세 번 맞은 것’은 부처님이 꽃을 든 것과 같고, 달마 대사가 9년 면벽한 것과 같으며, 구지 스님이 손가락 하나를 세운 것과 같고, 임제 스님이 할을 하고, 덕산 스님이 방망이를 휘두른 것과 같다고 보았다. 물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임제 스님이 제창한 무위진인(無位眞人: 차별없는 참사람)이 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그대들 모두 석가와 다르지 않다. 석가도 볼 줄 알고 그대들도 볼 줄 안다. 석가도 들을 줄 알고 그대들도 들을 줄 안다. 육근을 통해서 활발하게 작용하는 이 무위진인은 한 순간도 쉰 적이 없다. 이 사실을 알면 단지 ‘한평생 일 없는 사람(一生無事人)’일 뿐 달리 부처다 조사다 할 것이 없다.”
| |||
<임제록>의 알짜요 고갱이다. 임제선에서 ‘바로 목전에서 법을 듣고 말할 줄 아는 마음’인 무위진인(無位眞人, 불성)은 ‘바로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작용(卽今目前現用)’을 의미한다. 임제 선사는 지금 눈앞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바로 만법의 근원이며, 이것을 깨달아야 경계의 장애로부터 해탈한다고 말한다. 행주좌와 어묵동정 가운데 보고 듣고 인식하는 작용에서 늘 지금 눈앞의 일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그 무엇에도 걸림없이 매 순간 어디에서도 주인노릇하며 진실과 마주하는(隨處作主 立處皆眞)’ 것이다.
무비 스님은 “육근을 통해 보고 듣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이 작용이 신통과 묘용”이라면서 “ 이보다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간단한 불교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수행자들은 여전히 “부처는 구할 수 없고, 도는 이룰 수 없고, 법은 얻을 것이 없다”는 임제 스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밖으로 부처와 깨달음을 구하는 갈망을 멈출 수 없기에, ‘지금 여기’에 온전히 함께 하는 불법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날 대승암에서는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 스님이 중국에서 임제종 18대 조사인 석옥청공 선사의 법을 이어받아 환암-구곡-벽계-벽송-부용-청허 스님 등을 거쳐 조계종으로 이어져 온 임제정맥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법석이었다. 조계종의 근본 선어록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강설한 이가 없었던 <임제록>이 무비 스님의 활발발한 선적인 안목으로 되살아난 것은 새로운 선풍 진작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