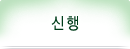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 ||||
늘 머릿속에는 ‘조사어록이 경전보다 공부에 요긴한가, 더 높단 말인가’ 하는 궁금증 속에서 참선과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법화경>은 예산 수덕사 선방 시절부터 읽었습니다. 당시 방선만 하면 <법화경>을 꺼내 읽었는데, 선방 대중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법당에 가서 혼자 읽었지요. 그때 <법화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닿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법화경>을 읽을 때, ‘이것이 일승이다’고 하는 것보다 ‘전생에 이렇게 닦아서 지금에 와서 성불했다’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법화경>을 똑바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틈틈이 읽으며 그 대의를 알게 됐습니다. <법화경>이 좋은 까닭은 ‘부처님께서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법문때문입니다. 그럼, 일대사인연이란 무엇일까요?
중생에게 불지견(佛知見)을 열어(開) 보이고(示), 깨달아(悟) 거기에 들게 하기(入)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지견은 무엇일까요? 한 마디로 일불승(一佛乘), 또는 일승(一乘)입니다. 여기에는 트집 잡을 만한 것도, 또 아무 하자도 없습니다. 다른 말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의 지견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의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부처의 지견을 이룬다?’ ‘부처의 지견이 무엇인데, 이것을 열고 보이며 깨달아 들게 한다는 것인가’ ‘부처의 지견이면 그만인데, 왜 중생들에게 개시오입하게 한단 말인가’ 등의 의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어느 스님이 ‘<화엄경>과 선(禪)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스승에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스승은 ‘무진성해합일미(無盡性海合一味 : 다함이 없는 성품 바다가 한 맛에 합친다)’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한 맛’, 즉 일미(一味), 이것은 <화엄경>입니다. 또 ‘일미상침시아선(一味相沈是我禪 : 한 맛까지도 다 쓸어 없애는 것이 나의 선이다)’이라 했습니다. ‘무진성해’는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요긴한 것은 ‘일미’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맛’이란 말은 결국, 일승을 의미합니다. 모두 일승에서 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승이란 말까지도 치워 없애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선과 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일승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소승(小乘), 중승(中乘), 대승(大乘) 일승(一乘) 등으로 말입니다. 가령 화엄 학자들은 <화엄경>을 일승이라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일승원교(一乘圓敎)라 하지요. 법화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화경>을 대승종교(大乘終敎)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승의 관문에 들어가는 것을 법화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태지자 스님은 반대입니다. <화엄경>을 설할 때는 아직 부처님의 제자들이 없이, 깨친 경지를 시방세계 대중들에게 설했기에 대승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 40년째를 맞아 <법화경>을 설했습니다. 천태지자 스님은 <법화경>이야 말로 일승사상이라고 했던 겁니다. 교학자 대부분은 <화엄경>을 일승(一乘)이라 하고, <법화경>을 대승종교라 하지만, 천태 지자 스님은 <법화경>이 일승이고, <화엄경>은 대승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맞을까요? 사람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천태지자 선사의 천태종 계통에서는 <법화경>을 첫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런데 원효 대사는 “부처님은 항상 일승만을 설했다. 그러나 사부대중이 일승을 못 알아들으니, 사부대중의 근기에 맞게 소승, 중승, 대승 등으로 일승을 설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소승부 경전이라 보는 아함부 경전도 일승만을 설했고, 방등부 경전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효 대사의 말에 따르면,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 전체가 오직 일승만을 설한 셈입니다. 일승을 사부대중이 못 알아들으니까, 근기에 따라 이것저것 설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함부 경전이라고 법문이 낮고,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라고 법문이 더 수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똑 같은 것입니다. 일승을 설했기 때문입니다.
원효 대사의 이 같은 교상판석은 중국, 일본에도 없는 독특한 사상입니다. ‘부처님은 오직 일승만 설했고, 대중들의 근기에 맞게 소승 중승 대승 등 여러 가지로 설했을 뿐’이란 원효 대사의 사상은 선과 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해줍니다. 전부 일승이란 시각에서는 ‘선이다, 교이다’라고 붙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더더기가 되는 셈입니다.
<법화경>에는 ‘대통지승불(大通智勝佛)’이란 부처님이 나옵니다. 대통지승불은 10겁, 즉 54억만년 동안 도량에 앉아 좌선을 했지만,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 불도를 이루지 못한 부처님입니다. 이를 교학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들 것입니다. 여기서 10겁은, <화엄경>에서는 10바라밀이라 하고, 다른 교학자들은 10악이라고 합니다. 먼저 10악이라고 보는 것은, 10겁을 도량에 앉아도 10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불도를 이루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선(禪)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통지승불’이 부처님이라면, 부처의 눈에는 우주법계 모두가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엄경>에서 ‘한 부처님이 세상에 나면, 이 우주법계가 전부 부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두두물물이 모두 불법이듯이, 대통지승불이 부처인데 10겁이든 100겁이든 부처 앞에 무슨 불법이 현전하겠습니까. 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교학적으로 문자에만 얽매여서 해석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안목을 높여서 보면,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 10겁이든 100겁이든 한 찰나동안 앉아있든지, ‘불법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이미 부처님 세계에 있는데, 불법의 현전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언어ㆍ문자에만 집착해서 보면, <법화경>은 아함부 경전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언어ㆍ문자에서 벗어나서 보면, <법화경>은 ‘일승원교’ 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승만을 설했다’는 원효 대사의 말처럼, 부처님은 <법화경>이든 <아함경>이든 일승만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런 안목으로 보면, <법화경>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경전입니다. 물론 다른 경전이 못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법화경>에서는 하나하나가 요긴한 말씀들입니다. 나는 늘 ‘과연 일승이란 무엇일까?’하고 의심했습니다. 물론 교학적으로 해석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해석보다도 조용히 아침ㆍ저녁으로 참선하면서, 그 의문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두는 어디로 가버리고, ‘일승이란 무엇인가’란 이 말만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것에 가장 가까운 화두가 ‘만법귀일 귀일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인고?’ 입니다. 만법은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이고, 귀일(하나로 돌아간다)은 일불승, 일승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그 하나는 <법화경>의 일승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로 문자로 이해하면, 이미 일승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군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 ||||
조선시대 함허득통 선사(1376~1433)가 얻은 두 번의 견성체험도 바로 <법화경> ‘방편품’ 게송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허 선사가 달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정수병을 뚝 떨어뜨리게 됐습니다. 그 순간, 깨지는 소리를 듣고, 머리 속에 몰록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차일사실(唯此一事實) 여이즉비진(餘二卽非眞)이니라.’ 즉 ‘오직 이 하나만이 사실이요, 나머지가 둘이면 이미 참됨(진여)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법화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오가해>를 쓰신 다섯 분의 고승 가운데 유일한 한국 선지식인 함허 스님의 초견성입니다.
여기서 ‘한 사실’은 일승을 말합니다. 이를 한 차원 높여보면, 언어의 길이 끊어진 자리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선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번은 함허 선사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다가, 문득 안개 낀 회암산에 봉우리만 불쑥 튀어나온 풍경을 보고 깨침을 경험합니다. ‘행행홀회수(行行忽回首), 산골입운중(山骨立雲中’)이라,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문득 고개를 돌이키니, 산 뼈가 그 구름 속에 서있더라’고 말했습니다. 산 밑에서는 안개가 하얗게 끼었는데, 산봉우리만 우뚝 서있다는 것입니다. 함허 선사는 두 번에 깨침의 기쁜 맛을 보고는 일대사인연을 해결했습니다. 이 두 번의 내용 모두가 <법화경>의 이야기들입니다. 때문에 <법화경>을 보고서 못 깨친다는 것은 헛소리가 됩니다.
<법화경>이든 <능엄경>이든 깨치면 그만입니다. 이처럼 함허 스님의 깨침은 선과 교, 경전과 참선이 ‘둘이 아님’을 여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치는 사람에게는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직 최고의 진리만을 설했다’는 원효 대사의 말씀이 너무도 지당합니다.
<법화경> ‘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에 상불경보살이 나옵니다. 항상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공경하는 보살입니다. 상불경보살이 얼마나 상대방을 공경했는지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상불경보살은 늘 땅만 바라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묻기를, “왜 보살님은 땅만 바라보고 다닙니까?” 하니, “내 발 밑에서 밟혀죽는 저 미물 중생이 나보다 먼저 성불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그 미물 중생이 혹시 내 발에 밟혀죽을까 봐 그것을 피하려고 땅만 보고 다닙니다”고 답했습니다. 사람 공경은 물론이고 미물 중생까지도 해치지 않으려는 공경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상불경’이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상불경보살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곧 “내가 전생에 상불경보살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부처가 된 것은 그때 상대방을 공경했기에 성불할 수 있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상불경보살. 그 분이 바로 부처님의 전생이었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가르침입니까. <법화경>의 일승사상을 선양하는 대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닦아나가 성불할 것인가를 비유한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상불경보살 같은 선지식들은 대놓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작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리석게 굽니다. 기고만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래 선지식 가운데 하심으로 유명한 지월 스님이 계신데, 바로 이 분이 상불경보살 같은 선지식입니다. 지월 스님은 신분이 높고 낮음에도 상관없이 무조건 “그렇습니다” 하고 하심을 했습니다.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만족할 줄 알았던 지월 스님이야말로 상불경보살이었습니다.
상불경보살 이외에도 <법화경>에는 환희심 나는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승이다. 이것이 불지견이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앞부분에서만 ‘부처님이 일대사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말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이 일승인지’에 대한 말씀은 정작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승의 가르침을 언어ㆍ문자로 말해버리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경전을 언어ㆍ문자로 이야기하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전부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행자들은 경전 밖에 깨달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줄거리로 볼 때, 부처님이 성불해 처음 설한 <화엄경>과 40년 후에 설한 <법화경>은 불교 골수를 다 담아낸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화경>은 일승사상을 말하기 위해 소승, 중승, 대승 등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중생의 근기를 성숙시킨 경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보면 일승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에 뜻을 얻고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이지만, 마음에 뜻을 잃고 보면 팔만대장경도 모두다 마군의 설법이 됩니다. 팔만경전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바로 마음을 밝히면 이것이 일승인 겁니다. 내가 깨쳐야 합니다. 이전에는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경전을 떠나서 부처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함허 스님은 “이 일은 한 말씀으로도 다 할 수도 있고, 혹은 많은 말씀으로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마음에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에는 차별이 없다. 마음이 곧 부처요, 중생이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마음뿐임을 알면, 일승뿐임을 알게 됩니다.
질의
혜조 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불난 집’ 벗어 나려면 ‘허망함’ 도리 알아야
| ||||
[질문1]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일불승’ 사상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백운 스님] 함허 스님의 초견성 처럼 일상생활에서 구도에 대한 절실함만 있으면 됩니다. 홀연히 정견을 보면 깨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절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가 익어져야 계기가 오는 것입니다. 깨침은 꼭 이런 경우에서만 있고, 이렇게 돼야만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대혜 종고 스님도 발심은 선후가 있지만, 깨침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공부가 익어야 깨치고 말로써 깨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2] <법화경>의 비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화택(火宅)’ 의 비유가 있습니다. 지금 중생들의 눈에는 불이 나지 않았는데, 삼계 우주를 왜 불난 집에 비유했는지, 그 과정과 이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백운 스님] 목전에 보이는 걸 보고, 불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4대 독자를 가진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아들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세상에 아무 것도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불 난 정도가 아닙니다.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런 장면들을 무수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화택’이란 말이 비유 중의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불난 집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상 일이 허망한 것이구나’ 하고 그 허망을 알면, 거기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망을 알지 못하면, 가슴을 조이게 됩니다. 사실 허망한 것은 없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더 발심을 해야 합니다.
김호귀(동국대 선학과 강사)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다” 믿고 정진 하길
| ||||
[질문1] <법화경>에서 바라보는 불신관(佛身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백운 스님] <법화경>의 ‘구원성불(久遠成佛)론’을 말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어제 오늘에 성불한 것이 아니라, 구원겁 즉 오랜 시간 전에 이미 부처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겁 전에 우리 중생은 모두는 이미 부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번뇌ㆍ망상에 찌들어서 중생이 된 것이지, 우리는 본래 부처였습니다. 또 미래의 마지막 부처님 누지(樓至)불은 아침에 태어나 사시에 성불해, 유시에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세상과 우주 안의 온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시고 해질녘에 열반에 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판사를 하건 대통령을 하건 농부를 하건 중노릇을 하건 뭐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살다가, 누지불 시대에 이르면 다 같이 성불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생의 끝은 성불이란 말입니다. 구원성불론에서는 원래부터 모두가 부처였다는 말이고, 누지불 시대에 오면 다 제도가 돼서 성불해 열반에 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구원성불론과 필경성불론은 모두 부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중생들을 기쁘게 하고 희망을 줍니다.
[질문2] 앞서 스님께서 ‘대통지승불(大通智勝佛)이 10겁 동안 앉아 있었지만, 불법이 현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불법 속에 사니까 불법이 현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아직 불법 속에 살아가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불법 도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백운 스님] 도교의 성인으로 추앙 받는 장자가 어느 날, 제자와 개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바위 돌 징검다리였습니다. 건너가다가 보니 물고기가 맑은 물에 재밌게 헤엄치고 있어, 제자가 “선생님, 저 고기들이 아주 활발하게 헤엄쳐있는 걸 보니 행복해보입니다”라고 하니, 장자가 “네가 고기가 아니거늘, 어찌 고기의 마음을 안단 말인가”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분수에 넘는 것에 눈 뜨면 안 됩니다.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열심히 찾는 것 등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길이라 여기면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을 용케 만났습니다. 이 때 부지런히 경전을 독송하고, 틈틈이 또 앉아서 ‘내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를 참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하다가 보면, 금생에 이 몸뚱이로 성불을 못한다 해도, 그렇게 해서 나가야 깨침이 올 수 있습니다. ‘나는 중생인데’ ‘나는 늙었는데’ ‘나는 여자인데’ 등하고 낮춰서 자포자기를 한다면 말도 안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정리=김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