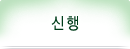서울 하계중학교 이미자 교사(48)는 1982년 교단에 첫 발을 디딘 이후 26년 째 학생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왔다. 하계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는 5년 째.
| ||||
교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학생들만 가르치면 되는 비교적 편안한 직업쯤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 . 하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요즘처럼 개성이 강하고 자유분방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각종 교무업무에 자기계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
이미자 교사는 하계중학교에서 2학년 수학을 담당하면서 특활부장을 맡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외에, 특별활동 과목을 편성하고, 방과 후 학교나 학예발표회, 학생작품 전시회와 같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역시 가장 많은 신경이 쓰이는 것은 학생들 지도.
“정도를 넘어서는 학생들이 많아요.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온갖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다보니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수행을 하게 됐어요. 일단 제 태도에 문제가 없는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했죠.”
2000년 서울 보리수선원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부터 이 교사는 아이들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충분치 않다고 자각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애심’이 충만해졌고 지금은 과거보다 한결 편안하고 성숙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해심 많은 선생님’으로 통한다.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오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학생들 입장에 서서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불성을 키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불자가, 교사가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학교든 교사들 사이에도 갈등은 있다. 하지만 이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의 갈등이 거의 없는 편이다. 성격이 둥글둥글한데다, 웬만한 것은 양보하고 웃으며 넘어간다. 그래서 동료 교사들로부터 “명상을 해서 그렇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교사는 작년에 동료 교사 7명과 명상동호회를 만들어 학내에서 정기적으로 수행모임을 가졌었다. 지금은 모임 공간이 없는데다, 함께 모임을 했던 교사들이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바람에 중단됐지만 여건만 되면 다시 모임을 가질 생각이다.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할 일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도 부처님 일이니 더욱더 보람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