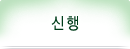3월 31일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 세 번째 주제인 ‘한암대종사와 금강경’에 대해 강의한 현각 스님(원주 성불원장)은 “평생 동안 터럭만큼도 틈이 없는 엄격함을 보인 한암 스님의 수행가풍과 조계종단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현각 스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평창 오대산은 한암 스님의 수행가풍이 면면히 이어져 오는 도량입니다. 스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스님을 시봉했던 제자들을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한암 스님의 생애, 정신, 면모 등을 조금씩 엿볼 수 있습니다. 한암 스님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대산 스님들이 남쪽 지방의 선방에 내려가 수행정진하기 위해 어른스님에게 인사를 하면, ‘어디서 왔는가?’란 질문을 받습니다. ‘오대산에서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어른스님들은 오대산 스님들을 인정합니다.
| ||||
오대산 출신 스님들은 어디에 데려다놓아도 제 몫과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지요. 그것이 바로 한암 스님이 주창한 승가오칙(僧伽五則)에 근거한 것입니다. 스님이 되면 다섯 가지 분야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선으로써 지혜를 얻어 구경성불의 기틀을 세우고, 염불로써 중생구제의 뜻을 세우게 했으며, 간경으로써 바른 정견을 곧추 세우게 했고, 의식으로써 윤리의 사표가 되게 했으며 마지막으로 가람수호로써 불교토장엄의 원력을 갖게 한 것입니다.
요즘 들어, 누구든지 한 가지만 잘 하면 된다는 교육풍토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노래든 춤이든 체육이든 하나만 잘 하면 된다는 것인데, 사실 이런 교육법은 다른 분야에는 쓸모가 없는 의미도 됩니다. 이런 교육방법이 옳은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팔방미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조금의 소홀함이 없고, 어느 분야든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행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 자세라고 봅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오대산 기운을 입은 사람들은 어느 한 분야에도 소홀함도 막힘도 없어야 합니다.
한암 스님과 관련된 일화 한 자락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암 스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쉰 살쯤에 서울 봉은사 조실을 끝으로,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스님은 이 말을 남기고 강원도 오대산으로 들어가 27년 동안 동구 밖을 나오지 않은 채 선 수행에 몰두하셨지요. 조선조 500년 동안 유교에 밀려 흔적도 없을 정도로 지리멸렬된 근대한국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경허 선사의 원력이 한암 스님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경허 선사의 수행가풍을 이어받은 한암 스님이 어느 추운 겨울 날, 상원사에 있을 때 노비구니 스님이 적멸보궁 참배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한 나머지 날이 저무는지도 몰랐던 노비구니 스님이 간신히 상원사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날이 춥고 어두워, 원주스님에게 ‘하룻밤만 머물게 해달라’고 청했지요. 그래서 그 원주스님이 한암 스님에게 물었는데, 한암 스님이 일언지하에 “내려가라!”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묻자, 한암 스님은 “사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서 밝은 날에 내려갔을 것이다. 만약 노비구니 스님이 기도를 잘 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신심과 기도가 깊으면, 호랑이 만날 걱정도 추위 걱정도 할 필요도 없다. 길을 나서면 길을 밝혀 줄 것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 줄 것이다”고 했습니다.
경전에서도 신심이 깊으면 물에 빠져도 물에 젖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암 스님은 또 “수행자가 밤이 무섭고, 추위가 무섭다면 쓸데없는 수행자”라며 단호히 내치셨습니다. 이 일화에서 터럭만큼도 틈이 없는 엄격함을 보여준 한암 스님의 수행력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암 스님의 수행가풍과 부처님의 말씀인 <금강경>과 연결하고자 합니다. 한암 스님의 일생 면면에 엄격함 속에서 따뜻함이 있고, 부러움 속에서 강함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정신과 한암 스님의 수행은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금강경>은 뜻을 알든 모르든 신도들은 수없이 독송합니다. 조계종단에서는 소의경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의경전이란 것은 이 경전을 의지해서 수행하고 또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의지하는 부모님처럼 <금강경>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한국불교에서 <금강경>은 부모와 같은 경전입니다.
불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입니다. 남방은 소승, 북방은 대승이라고 합니다. 남방불교는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원형대로 전해지기를 고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탁발행렬이지요. 생활모습도 부처님 당시 그대로를 추구합니다. 북방불교는 부처님의 사상적인 면은 시대별로 개혁적이고 진취적으로 계승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금강경>은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근본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훨씬 개혁적이고 파격적인 면모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대승시교(大乘始敎)라고 합니다.
<금강경>의 내용은 마음의 흐름을 딱 눈앞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알아차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중생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수보리존자와 문답으로 쉽게 말합니다.
<금강경>의 핵심적인 질문은 수보리존자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발하면, 어떻게 그 마음을 쓰며 항복받겠습니까?”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됩니다. 이후에는 27번 걸쳐 의심하고 답변하는 내용들로 돼있습니다.
그럼, 보리심을 발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금강경>에서 세 가지 마음으로 세상을 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광대심(廣大心)입니다. 한량없는 넓고 큰 마음, 즉 ‘일체중생을 내가 모두 제도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제일심(第一心)입니다. ‘일체중생을 모두 제도는 했다’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부도심(不度心)’입니다. 일체중생을 제도했다는 마음도, 제도된 일체중생도 없는 마음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만든 만다라를 그려 완성한 뒤, 순식간에 집착 없이 빗자루로 쓸어 없애버리는 이치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다음에는 무엇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그릇에 무엇을 담았으면 새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담는 순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새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처음과 끝이 없는 무궁무진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한암 스님의 엄격한 수행가풍은 <금강경>의 핵심 내용인 ‘견(堅:금강처럼 견고함)’, ‘예(銳:칼처럼 예리함)’, ‘명(明:진리의 밝음)’ 등과 일맥상통합니다. <금강경> 자체가 ‘능단금강(能斷金剛)’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무엇도 능히 잘라내는 금강이라는 의미이잖습니까? 한암 스님의 일생과 수행가풍은 이처럼 불의와 시비 등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진리의 칼’이었습니다. 진리탐구에 몸을 사리지 않았고, 온갖 권력에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금강경>의 정신이 스님의 수행에 냉철하고 투철하게 배어있는 것입니다. 공의 정신으로 한결같이 살아온 수행자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