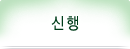개인적으로 ‘리더십 컨설턴트’라는 직함을 쓰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외국에 나갔을 때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국토의 크기에 놀라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레 형성되는 그들 생각의 크기에 자못 자존심이 꺾이기 일수였다. 이런 크기를 보고 자란 아이들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 내게 파고든 의문이었다.
| ||||
게다가 그런 아픔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하루 중 단 몇 초, 일년 중 단 몇 일뿐일 텐데도 이상하게 그 느낌은 하루 종일, 혹은 1년 내내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가! 서른을 훌쩍 넘어서 젊음의 특권인 패기와 도전정신 같은 것이 많이 남지 않게 되었을 때도 그런 고통은 오히려 줄지 않고 더 커져만 갔다.
그런데 고통은 다른 고통들과 어울려 증폭되는 속성이었다. 또 고통의 크기가 다른 것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됐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상의 고통들도 서로 뭉치면 아주 가끔은 눈덩이처럼 커지기도 했다. 직장,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함 등,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아픔은 어김없이 따라 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순간순간의 아픔과 함께, 마음 한 쪽에 봉인해 두었던 ‘이런 삶을 다시 반복해야 한단 말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까지 튀어나와 더해질 때였다. 그럴 때는 정말 며칠씩, 심지어는 몇 달씩 세상 살 맛 전혀 안 나기도 했다. 매일 반복되는 듯한 일상도 어떤 때는 견딜 수 없이 지루한데, 만일 이런 삶이 반복되는 거라면 그 고통을 어찌 감당한단 말인가?
그런 주기적인 고통이 온다는 걸 인식할 때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맘에 안 드는 날의 주기가 점점 빨라질 때쯤, 그래서 뭔가 이 고통을 다루는 기술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 실컷 아플 때쯤 비로소 부처님의 수행법을 만나게 됐다.
불교계 언저리에 슬쩍 한 발을 담그고 가끔 봉사활동 한답시고 기웃거리던 20대를 보낸 덕인지, 다행이 꽤 많은 분들이 수행을 지도해주실 스승과 수행법에 대해 소개해줬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근기가 형편없는 건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학교 체육 시간에 100미터 달리기를 할 때도, 손을 휘젓는 방법이라든가 보폭의 크기라든다 발을 디딜 때의 착지 방법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경험에 의해 정리돼 있듯이, 수행도 그런 구체적인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잘해라” 혹은 “구체적으로 잘 해라” 수준의 답은 곤란할 듯 했다. 그러니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익혀보겠다고 찾아가서, 고통의 제거는커녕 스승이라 알려진 분들의 어이없음과 불교에 대한 심한 회의를 덤으로 얻어오는 게 다반사였다. (계속)
관련 링크 : 부다피아 수행법 메뉴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