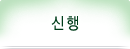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 ||||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될까?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이 준 상처, 그 상처로 인해 생겨난 미움과 분노, 증오…. 몸에 난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도록 옭아매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처럼 상처를 다시 마음 한구석에 담아 둘 것인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인가?
본사와 공주 마곡사(주지 진각)가 공동 주최하는 ‘마곡사 여름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는 이처럼 나의 상처를 바로 보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제1차 ‘치유명상’ 템플스테이가 처음 시작된 7월 1일, 장맛비를 뚫고 28명의 참가자들이 마곡사로 모여들었다. 제각기 안고 있는 상처는 다르겠지만, ‘불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였다.
처음 본 사람에
| ||||
‘물망초’ ‘무념무상’ ‘허공’ ‘초야’ 등 나름의 사연과 서원이 담긴 이름표를 달자, 자신과 타인의 이름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말문이 열렸다.
곧이어 진행된 서로의 장점 말해주기, 바닥에 마주 앉아 손과 발을 맞대고 서로 일으켜주기, 서로 엇갈리게 잡은 손 풀어보기 등을 통해 참가자간의 거리감을 조금 좁히는 데는 일단 성공.
저녁 공양과 예불 후 다시 법당에 마주 앉은 참가자들에게 마가 스님은 참가자들을 두 줄로 눕힌 후 ‘김밥말기’를 해보자고 제안한다. ‘오늘 처음 만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몸 위를 구르라고?’ 한동안 적막이 흐른다. 몇 번의 재촉 끝에 할 수 없이 어정쩡한 자세로 구르기를 시도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느덧 쑥스러움과 낯설음은 저만치 물러나고, ‘김밥말기’는 신나는 놀이가 된다. 어떤 힘이 우리를 이렇게 함께 뒹굴고 웃고 울게 만들었을까?
| ||||
한 시간에 걸친 산책이 끝나자 첫째 날 일정이 마무리됐다. 남은 이틀간의 일정 동안 어떻게 내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와 설렘을 안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산사의 하루는 어김없이 새벽 3시에 시작됐다. 여느 때 같으면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이제 막 잠들기 시작할 무렵이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새벽 예불을 마친 참가자들이 넘어야 할 산은 ‘자신을 위한 108배’. 묘운 스님의 죽비소리에 맞춰 한 배 한 배 절을 올린다. 자신을 위한 절.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자 용서다.
| ||||
땀으로 젖은 몸을 이끌고 컴컴한 새벽 숲길을 걷는다. 자동차를 타고 지나갈 땐 볼 수 없었던 고사리며 반딧불이며 머루를 눈에 담으며, 어슴푸레 밝아오는 길을 되짚어 온다.
발우공양으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자, ‘가족 긍정 명상’이 이어졌다.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을 떠올리는 시간이건만 참가자들은 못해 준 일, 힘들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른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더 깊은 상처를 내고 마는 가족을 생각하며 모두가 눈시울을 붉힌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들은 가족을 떠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고 있었다. 산길을 맨발로 걸으면서도, 툇마루에 앉아 비 내리는 마곡사를 바라보면서도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한때 거식증으로 너무 고생했어요. 그때 저보다 더 많이 울고 마음 아파하셨던 어머니가 생각나요. 이제 가족들을 더 사랑할 거예요.”(여름)
저녁 공양 후, 이제 드디어 내 상처와 마주할 때가 됐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기 전에 해야 할 일은 ‘거짓된 나’를 내려놓는 것.
노래에 맞춰 온갖 몸짓을 선보여야 한다는 마가 스님의 말에 모두의 얼굴에 다소 난감한 표정이 스쳐간다.
“아직 ‘하면 안돼’ ‘나는 못해’라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보리밥집이라, 쌀밥도 없고 자장면도 없어요. 보리밥이 싫으면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괜히 왔다’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여기 오기 전의 나와 달라질 수 없어요. 새로운 나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스님의 독려에 힘을 얻은 참가자들은 ‘뱃노래’에 맞춰 마음껏 망가져(?)본다.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몸이 열리자 마음도 함께 열린다.
“그동안 왜 이렇게 망가지지 못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걱정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외로운 연꽃)
한 바탕 공연이 끝나고 이제는 ‘유서’를 써야 할 시간이다. 20분 후에 죽음을 맞게 된다면, 나는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남기게 될까? 그동안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상처는 ‘죽음’ 앞에서 눈물과 함께 용서와 화해로 바뀌어 간다.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 유서를 태워 보낸다. 새로운 삶을 살면 꼭 해보고 싶은 일도 정리해 본다.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정도 상처로 힘들어했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 새 삶을 얻었으니 좀 더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야지요.”(하늬바람)
| ||||
나를 괴롭히던 상처쯤이야 없어지지 않은들 어떠랴. 이제 그 상처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졌으니, 그것은 이미 상처가 아니다.
“상처는 누가 치유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더라고요.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