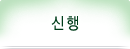해안스님의 ‘금강경 강의’
서문 읽는 순간 가슴 뭉클
세상에서 물러나는 방식(出世間)으로 세상과 화합화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스님이다. 자신에 대해서는 지극히 엄격하지만 중생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애롭기를 발원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스님이다. 그래서 모든 승가는 종파를 불문하고 ‘자비문중’일 수밖에 없다. 고우면서도 유약해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도 고즈넉함을 잃지 않는 절, 내소사. 언제 보아도 갓 쓸고간 싸리비 자국처럼 정갈한 도량이다. 이런 곳에서 스님을 뵙는 일은 참으로 기껍다.
마지막 가을 햇살이 색색의 단풍으로 빛나는 내소사 뜨락에서 혜산 큰스님을 뵈었다.
“성불하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 ||||
그러나 이때까지도 출가 수행자로서의 시절 인연은 도래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후 해안 스님과의 인연은 움을 틔우기 시작한다. “대학 졸업 후 은사 스님(해안)과 서신 왕래가 시작됐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편지로 여쭈었지요. 그러면 스님께서는 자상하게 답변을 해 주곤 하셨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은사 스님께서는 법문하실 때 간혹 편지를 꺼내 보이시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한 삼년 동안 편지를 주고 받았어요.”오늘날처럼 전화가 흔한 시절도 아니었으니 그 사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절했을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전부 이럴 수 있다면,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반목과 다툼은 발 붙일 자리조차 없을 텐데, 하는 상상(?)을 해 본다. 시절 인연은 무르익기 시작하고, 드디어 스승과 제자는 상봉의 날을 맞는다. “은사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지장암(내소사 부속 암자)에서 ‘특별 정진 법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 정진 법회란 뭔고 하니, 스님들처럼 안거를 할 형편이 못되는 불제자를 위한 정진의 자리였어요. 이걸 두고 요즘와서는 ‘재가선방’의 효시라고들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본디 은사 스님께서는 깨달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승속 불문이셨어요. ‘본래면목’을 보는 것, 이것이 불교의 근본 종지라는 점에 누구보다도 투철하셨지요. 안거가 불가능한 보통의 신도라고 해서 심인을 증득하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견성하지 못하면 온전한 불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 ||||
여기서 우리는 해안 스님에게서 혜산 스님으로 이어지는 내소사라는 절집의 ‘가풍’을 읽을 수 있다. 재미삼아 스님의 지난 얘기를 들춘 게 아니라, 바로 그점을 얘기하기 위해서였다. 그 하나, 성불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 신념을 인연 닿는 중생 모두에게로 확산시킨다는 점이다. 한국 불교가 정화의 진통을 겪고 있을 때 승속을 불문한 일종의 수행 결사체인 ‘전등회’를 만든 것이 좋은 예다. 지금은 면모를 일신한 서울 성북동의 전등사도 해안 스님 당시에 서울 지역의 불자들을 위해 수유리에 터를 마련한 것을 혜안 스님께서 70년대 말에 지금의 자리로 옮기면서 기반을 다지게 된다. 지금도 내소사에서는 매년 3월 초하루부터 해안 스님의 기일인 7일까지 특별 정진 법회를 연다. 내소사의 이런 가풍은 이렇듯 뿌리가 깊다.
약간의 침소봉대를 무릅쓰고 시간의 저편으로 거슬러올라 가 보자. 내소사의 창건은 백제 무왕 34(633)년 해구 두타(惠丘頭陀) 스님에 의해서다. 두타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시작부터가 오로지 불도를 닦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 도량이 바로 내소사인 것이다. 그후 조선 인조 11(1633)년 청민(靑旻) 선사가 중건을 하고 구한말(1902년)에는 대강백이자 율사이셨던 관해 선사가 당시 땡초의 소굴로 전락한 절의 면모를 일신했다. 이후 만허, 해안, 그리고 오늘날의 혜산 스님으로 그 맥이 이어진다.
그럼 여기서 잠시, 혜산 스님의 성불론에 귀기울여 보자.
“불제자라면 마땅히 성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엄두가 안나면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성불 못할 이유가 없다’ 하고 말이예요. 만약 불가능 요인이 있다면 그건 인과 때문이예요. ‘본래부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처의 삶이 어려운 것도 그것 때문이예요. 그런데 선의 차원에서 보면 이런 말이 군소리로 들려요. 하지만 중생의 편에 서서 보면 방편을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할(喝) 방(棒)만이 능사가 아니지요. 중생은 아직 깨치지 못한 부처예요. 다만 무시이래로 지녀온 습성 즉 습기(習氣) 때문에 경계에 부딪칠 때마다 그 경계에 따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서 비롯됐다는 말이예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때리면, 이 또한 어느 생에선가 내가 그 사람을 때린 과보로 알고 먼저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인과를 아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평생 살다 보면 최소한 고의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금생의 선행으로 다생의 업을 깨끗이 하는 것이지요. 숙세에 걸친 이 ‘습기’라는 걸 쉽게 말하면 ‘버르장머리’예요. 이걸 고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과’의 도리를 확실히 알고 성불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내소사의 가풍 하나를 읽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쉽게 불법을 전한다는 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체득해야 합니다. 체득하면 곧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싹 가셨으니까요. 머리로 아는 사람은 가다가 돌아서고 가다가 돌아서기를 반복합니다. 소용없는 ‘앎’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일찍이 쉬운 법문을 주창하셨어요. 금강경과 반야심경, 십현담에 대한 해설도 탁월하시지만 강의 노트를 보면 거의 순 한글이예요. 그러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계합한단 말이예요.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법을 설할 수 없어요. 한 예로, 대부분의 <반야심경> 번역문을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蜜多時)…>를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고 하는데 해안 스님께서는 ‘깊이’라고 번역하셨어요. 단 한자 차이지만 뜻을 새겨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는 단순한 번역 기술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계합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법문은 쉽고 시원합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바로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법문을 하고, 게송도 한글로 하고 그럽니다.”
혜산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은사 스님에 대한 얘기가 너무 자주 언급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두 분의 모습이 포개지기 때문이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스승과 제자의 사이의 정이 너무도 도탑다는 점이다. 이 또한 내소사라는 절집의 돋보이는 점이다. 어느 절집이고 안 그런 데가 있을까만 내소사는 각별하다.
“이번에 은사 스님이 남기신 법문이나 경전 번역·해설을 모아서 <해안집>이라는 이름으로 세 권의 책을 냈어요. 입적하신 지 27년만의 일이지요. 20년전 쯤에 1권을 간행했습니다만 거기에 담지 못한 글과 녹음을 이번에 정리했어요. 60년대 초중반부터 스님을 모시면서 법문을 하실 때마다 녹음을 했는데, 스님 가신 햇수가 더할수록 참 잘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승에 대한 태산 같은 신뢰가 듣는이의 가슴까지 뜨겁게 한다. 단풍보다 더 아름다운 사제의 정을 내소사에서 본다. 또한 그런 관계가 혜산 스님과 제자들과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물러나는 인사를 올리고 나니 어느새 저녁 공양 시간이다. 사중 스님들의 배려로 큰스님 곁에서 숟가락을 들었다. 스님께서는 반 정도 밖에 안 담긴 밥을 다시 반쯤 덜어내 놓으신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절밥이 꿀맛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스님게서는 덜어낸 밥을 다시 그릇에 옮겨 마저 드시는 게 아닌가.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들고 분위기를 살피니, 다른 스님들은 이미 숟가락을 놓고 정좌 중이었다. 혹시나 내가 민망해 할까 봐 일부러 밥을 더 드신 것이 분명해 보였다. 배보다 가슴이 먼저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