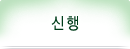말이라는 것은 소리의 높낮이에 생각의 차이를 담아 주고받는 소
| ||||
'말의 길이 끊기고, 생각의 자리가 사라진(言語道斷 心行處滅)'이라는 명제도 그와 같은 말의 한계에서 비롯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선(說禪)'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가 모순이 된다. 말할 수 없는 일을 말하려 하기 때문이다. 말할 수 없는 일을 굳이 말해야만 하는 까닭은 그 뜻이 미혹한 중생들에게 있기 때문이리라.
어쨌든 열 차례에 걸친 설선의 장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회향에는 '무차(無遮)'라는 타이틀이 붙게 된다. '막지 않는다'는 뜻이겠다.
'막지 않는다' 는 타이틀이 걸리는 까닭은 '막음'이나 '막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막음이나 막힘을 해소하려 하기 때문이다. '막지 않음'의 전통은 '막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막지 않음'이 형식을 가지게 되면, 그 형식이 다시 '막음'이 된다. 무차회(無遮會)는 그와 같은 또 다른 형식이다. 형식 안에서 '막힘'을 풀자는 것이 무차회의 연원이다. '막지 않음'의 형식은 다시 '막음'이나 '막힘'의 원인이 된다.
| ||||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도를 지키고, 대자대비를 실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내게로 와서 (시험 삼아) 부처를 모욕했다. 내가 묵묵히 대답하지 않자, 그도 모욕을 그만 두었다. 그래서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예물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예물은 그대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라고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내가 '그대가 이제 나를 모욕했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 허물이 그대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소리가 메아리로 돌아오고, 그림자가 몸을 따르는 것처럼 서로 떠날 수가 없는 법이니 나쁜 짓을 하지 말도록 해라" 고 하셨다. <사십이장경>
부처님 당시에도 이처럼 악의를 가지고 부처님을 시험하던 무리들이 있었다. 경전에 담겨 있는 가르침의 형식에는 이런 경험들이 담겨 있다. '막음이 없는 막음'의 전통이라고나 할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전통이 있다. 강원에는 이른바 문법오칙(問法五則)이라는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선지식에게 법을 물을 때 지켜야 할 예의나 규칙을 가르쳤다는 뜻이다. 이런 규칙들은 경전, 곧 부처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1, 막시문(莫試問): 시험삼아 선지식을 떠 보기 위해묻지 말 것.
2, 막무의문(莫無疑問) : 자신이 실제로 의심을 해 보지도 않고, 짐작하거나 가장해서 묻지 말 것.
3, 막불위회소범고문(莫不爲悔所犯故問) : 자기가 범한 허물을 참회하지 않고 묻지 말 것.
4, 막불수어고문(莫不受語故問): 선지식의 말씀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지 말 것.
5, 막어란고문(莫語亂故問): 횡설수설하여 난잡하게 묻지 말 것.
이를 선지식의 입장에서 풀어 놓은 불응오처(不應五處)라는 규칙도 있다. 부처님이나 선지식도 시험 삼아 묻는 말, 의심 없이 묻는 말, 참회 없이 묻는말,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 주장을 바탕으로 묻는 말, 난잡한 말로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차선회의 경험도 그렇고, 이번 설선법회에도 물음과 답변의 형식에 대한 불만이나 제안 등이 있었다. 특히 물음의 기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많았다. 있을 법한 제안이요, 불만들이다. 선지식은 한번 뵙기도 어렵다는데, 어려운 기회를 맞아 의심도 풀고 싶고, 점검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설선법회나 무차선회가 다 그러자고 하는 일이 아닌가?
무차선회로 설선법회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무차의 차, 막음이 없는 막음'의 형식에 대하여 생각을 돌이켜 보게 된다. 대중들이 선지식과 맞설 수 있는 희유한 기회, 이 기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형식들이다. 무차선회나 설선법회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형식들이다. 문법오칙(問法五則)과 같은 전통 속에서 새삼 선인들의 지혜를 느끼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