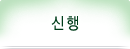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 ||||
이후 나는 인터넷에 ‘참선일기’를 연재하였는데, 얼마 후 스님께서 일기를 읽고 이런 지적을 해주셨다. “거사님이 ‘앉아서 자성을 기다린다’고 일기에 썼는데, 이미 물속에 있는 사람이 물을 다시 기다려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앉은 사람은 누구며, 또 기다리는 자성은 누구에게 속한 자성인가?”
지적을 받고 돌아보니, 나는 이전의 선체험을 되풀이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기다린다’는 표현을 쓰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불성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성을 기다리는 모순을 범했던 것이다. 나는 기왕 지난 선체험까지 돌이켜 보았고, 거기서 치명적인 잘못을 발견했다. 내가 나를 잡아 뺐을 때, 한 손으로는 나의 껍데기를 들고 눈으로는 알맹이를 보았는데, 미처 그것들을 ‘보는 자’가 있는 줄은 자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스님께 여쭤보았고, 스님은 “자성은 양변을 여의었다.”고 대답해 주셨다. 그 당시 ‘보는 자’가 남아있음으로써, 나는 ‘보이는 것’과 ‘보는 자’가 있는 양변에 떨어졌던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내가 체험했던 것을 부정당하게 되니 앞뒤가 꽉 막혀 답답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후 참선 중에, 껍데기와 알맹이 그리고 보는 자의 셋이 모두 부정된 그 막막한 공간에 무엇인가가 숨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셋 모두 자성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가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쓸려나간 뒤 남아있는 ‘바닥’의 발견. 나는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중도’를 찾은 것이다. 나는 속이 시원해졌다.
나는 이 사실을 스님께 말씀드렸고, 스님은 미소를 띠며 “많이 왔네. 이젠 생활 속에서 공부하시오.”라고 짧게 대답하셨다. 이후 나는 생활 중에 부닥치는 경계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공부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의 생생한 자성 대신에 자꾸 지난 선체험 때의 느낌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두 번째 체험 역시 하나의 마장(魔障)이 되어 내 마음을 과거에 얽매이게 했던 것이다.
이후 나는 나의 체험을 완전히 버리고 처음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참선에서는, ‘나의 수행법’은 없고, 단지 불조가 확립하여 내려오는 ‘바른 수행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선원장스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믿고 가르쳐주시는 대로 다시 시작하였다. 먼저 그동안 허공중에서 화두를 들어온 것을 반성하고, 화두가 자리 잡을 땅을 먼저 다졌다. 나는 “일체 중생 안에는 깨닫는 성품이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안에 있는 깨닫는 성품, 즉 불성을 관(觀)하여 감지하도록 노력했다. 불성이 감지되어야, 거기서 의정이 생긴다. 그리고 불성에 의지해야, 번뇌 망상이 조복된다. 참선의 첫걸음은, 화두를 들기 전에, 불성을 관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나는 그렇게 했다.
이제 나는 생활 중에 늘 깨어서 ‘보고 듣고 자각하고 아는 것(見聞覺知)을 대하는 자’를 감지하려고 노력한다. 매 경계마다 자성을 감지하고, 그것을 주시한다. 익숙해지니까, 이미 자성을 감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계를 만나게 된다. 만나자마자 의정 속에 있게 된다. 나날이 의정에 대한 확신이 자라가는 것을 느낀다. 언젠가 의정이 터져나가는 기연이 오겠지만, 이렇게만 해도 내가 변해가고 있으니 큰 욕심이 없다. 참선은 나를 바꿔가고 있고, 나는 다른 의심이 없어졌다. 나는 ‘깨닫는’ 참선보다 ‘사람이 변화되는’ 참선이 우선이라고 믿고 싶다. 나는 참선에 매달리는 생활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참선이 되는 공부길을 걷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