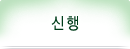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 |||
참으로 어수선한 시절이었다.
거침이 없는 역사의 물결, 그 속에 휩쓸리는 사람의 역사는 모래톱처럼 서걱 거렸다. 일제와 해방, 전쟁과 휴전선, 독재와 부패, 부패와 4. 19, 혼돈과 정치, 정치와 5. 16….
어수선한 것은 속세의 일만도 아니었다. 이승만대통령의 유시로 인해 정화의 깃발은 올린 불교계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 였다.
그 혼란의 물줄기는 끝이 없었고 끝이 없다는 것은 현실을 끝을 향해 치닫는 하나의 과정으로 묶어 두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절인연은 한 시점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머무름이 없는 것이 법계의 진리라면 또 다른 길로 발을 내딛는 것은 인간의 현실이었다.
“비구들이여, 모든이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둘이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행원스님은 전도선언을 외치신 부처님의 목소리를 생각했다. 혼자서 가는 길, 그 외로움을 이제 스님의 현실로 받아 들이기 위해서.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 됐다. 더이상 일본은 갈 수 없는 나라, 가서는 안될 나라도 아니었다. 반대의 외침도 36년의 뼈저리는 역사는 물밑에서 서걱이는 모래톱으로 남아 있어야했다. 이 또한 어수선한 시절인연의 한 과정일 수 밖에 없었다.
아무튼 행원스님은 일본행을 결심했다. 그것은 해외전법의 첫 결심이기도 했다. 스님의 일본행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그 싹이 텄다. 초동에 있는 동국대의 기숙사 지하실이었다. 이 기숙사는 본래 일본 서본원사의 별원이었다. 종단일을 맡았던 스님은 이 별원을 허물고 새집을 지으려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이없게도 그 지하실에서 4천여구의 유골이 발견된 것이다.
“일본군의 뼈무덤이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쩌기는. 원수의 유골인데 파묻어 버리든지 어디 바닷물에 던져버리지…”
놀라움과 새로이 솟아나는 분개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다.
“아니, 그럴 것이 아니야.”
스님은 달마회를 이끄는 몇 사람과 의논해 그 유해들을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화계사로 옮겨다 놓았다. 그리고 그 일은 금방 소문이 났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에서 실종된 가족을 찾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간 가족의 생사를 몸서리치며 궁굼해 하듯.
소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본에서 장관급 인사들까지 화계사로 몰려 왔고 가족의 유해를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다. 그 유해 발견은 국교 정상화에도 한몫을 했던 것이다.
일본은 정식으로 스님들과 정치인을 보내 유골을 인수해 갔으며 한국에서도 일본에 흩어진 동포의 유해를 찾아 왔다. 그러니까 양국간의 유해교환이 지울 수 없는 역사의 한 점을 지우듯 이뤄진 것이었다. 물론 이 행사에 행원스님은 중요한 업무를 맡았다. 1966년의 일이었다.
이때쯤 행원스님에게 편지가 왔다. 한번도 아니고 수차례 날아든 그 편지는 일본의 국회의원 오요다시 요시오의 것이었다.
‘스님, 일본으로 와 주십시오. 일본에서는 스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입니다. 이곳의 한국인들은 한국의 절을 원하고 한국의 불교를 원합니다’
당시 일본에도 한국인 스님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일본식 스님이 되어 일본식 불교를 가르치고 있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반쯤 무당이 된 경우도 있었다.
행원스님의 일본행은 요오다시 요시오만의 채근이 아니었다. 한국의 정부에서도 일본에 갈 것을 권유했다. 거기에도 이유가 있었다. 당시 동경에 평화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은 북한의 것이었다. 절이 북한 것이란 점은 문제될 것이 없었는지 몰라도 정작 큰 문제는 그 평화사가 교포들을 세뇌시키고 북으로 이송시키는 거점이란 점이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저런 이유들은 마침내 행원스님을 일본으로 가게하는 현실적 이유로 굳어졌다. 일본, 도쿄에 도착했을 때 반겨준 사람은 오요다시 요시오였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거듭거듭해 오던 요시오는 “고려사를 쓰라”는 후한 인심도 내보였다. 그러나 그 고려사는 이미 몇달전에 불타 버려 휑뎅그레한 터만 남은 사찰이었다.
그러나 희망은 있었다. 행원스님이 일본에서 포교를 한다면 2천만원을 한국불교의 해외포교란 명분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던 정부측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다. 행원스님은 그 정부의 약속을 믿고 도쿄 신주꾸에서 집을 고르고 있었다. 1천8백만원이면 사찰로 쓰기에 충분한 집을 살 수 있었다. 적당한 집도 골라 두었다.
그러나 일본 대사관에 신청한 지원금은 몇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점찍어 뒀던 집은 한 일본인이 사가고 말았다.
할 수 없이 다보이주에 셋집을 얻었다. 다달이 7만엔이란 큰 돈을 주어야 했다. 궁핍의 일본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신도도 없이 홀몸으로 시작한 일본 포교에서 넘어야 할 벽은 수 없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