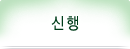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 ||||
찬란했던 몽골불교 현장에 서다
8월 11일 캠프 입재식. 간단사 주지 푸레밧 스님(몽골전통불교대학장)은 몽골 대륙 한 복판에 선 한국 청소년들에게 이 말부터 던졌다.
“여러분들은 찬란했던 몽골 불교문화 전통이 지나간 그 역사현장 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몽골 민족이 일찍이 각 나라의 문화의 정수를 받아들인 것 가운데 불교가 최고의 가르침이듯이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문화전통을 바탕으로 우리 한ㆍ몽골 청소년들이 미래불교를 힘차게 이끌어 나갑시다.”
이어 우리는선우 윤세원 운영위원장도 “몽골 체험은 자기 변화의 새로운 시도”라며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낄지 캠프 기간 내내 고민해보자”고 주문했다.
때문에 이번 캠프는 철저히 양국 문화체험, 탐방, 교류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12일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 짓기, 몽골 음식 만들기, 승마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그렇고, 13~15일 노래 배우기와 전통문화 공연, 체육대회 등이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로의 마음속에 양국의 문화를 아는 데 프로그램 일정이 짜여졌다.
몽골문화, 그 모든 것을 느끼다
| ||||
이 중 단연 인기는 게르 짓기. 게르의 뼈대인 ‘한’을 둥글게 드리우고, 원형 지붕인 ‘토오노’를 곧추 세운다. 그리고 양털을 누벼 만든 ‘에스기’를 덮어씌운다. 몽골 성인 2명이 1시간이면 족히 끝낼 게르 짓기. 하지만 2시간을 훌쩍 넘겨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툰 손놀림에 피식 웃는 표정이 밝다.
“한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의ㆍ식ㆍ주가 어떤 지부터 배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게르를 직접 지어보니 유목민인 몽골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요.” 유나(17ㆍ용인 서원고1년)의 소감 한마디가 똑 부러졌다.
캠프 사흘째. 청소년들의 몽골 말이 부쩍 늘었다. 꿀 먹은 벙어리였던 아이들의 말문이 트였다. 한국어 발음과 비슷한 몽골말만 나와도 금세 앵무새가 돼 버린다. 캠프에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몽골어 몇 마디를 배웠다는 다정이(14ㆍ명성여중 1년), 몽골 사람만 만나도 연신 ‘센 베노?(안녕하세요)’를 외치는 상민이(12ㆍ서울 대곡초 5년)도 몽골리언이 다 됐다.
대륙 초원서 몽골 친구들을 만나다
| ||||
잠시 후, 드디어 만났다. 단단히 벼렸다. 기다리는 동안 몽골말도 짬짬이 익혔다. 하지만 어색한 눈빛만 날린다. 준비한 인사말은 못하고, 연신 옆 사람과 수곤소곤이다. 그래도 슬슬 본색(?)을 드러낸다, 일은(16ㆍ대전 보문중 3년)이가 여지없이 침묵을 깬다. ‘비찬떼 하르떼(얘들아 사랑해!)’
양국의 문화 알기는 14일 수련원 극장에서 열린 ‘몽골 노래 배우기’로 이어졌다. ‘봄 봐야(기쁨을 즐겨요)’란 노래가 메뉴엘 올랐다. 몽골 강사는 피아노를 치며 가락을 가르쳐주지만, 아이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러시아 글을 차용한 키릴 문자와 몽골어는 아무래도 배우기 버거운 모양이다. 반복 후렴구에만 한국 아이들의 목청이 커지는 걸 보면….
“가사 뜻은 몰라도 노랫가락은 낯설지 않아요. 한국노랫가락 정서와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은 아마도 우리나라와 몽골이 한 민족이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들게 해요.” 희진(16ㆍ서울 양동중 3년) 이의 말이 인상적이다.
몽골반점 ‘후후털버’ 그리고 불교, 같은 민족임을 확인하다
| ||||
아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 거리도 비슷했다, 공부 부담, ‘한류열풍’의 주인공 영화배우 이야기, 컴퓨터 게임에 이르기까지 영락없는 어느 청소년들의 모습이었다. 불교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양국이 불교의 나라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있었다.
“불교는 엄마와 같은 존재예요. 언제나 넉넉하고 따뜻하게 제 마음을 끌어안아 주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울란반토로 간단사에 가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오유까(15ㆍOyuka, 울란바토르 15학교 8학년)는 불교가 ‘엄마’라고 말했다.
입학하자마자 불교학생회에 들어갔다는 지선(14ㆍ명성여중 1년) 이도, 몽골 친구들에게 사물놀이의 진수를 보여주기 위해 한 달 넘게 꽹과리를 연습했다는 새하(18ㆍ이리 남성여고 2년)도 장래 꿈인 디자이너라는 엘카(17ㆍ베이징 55중학교 4년 유학중)도 불교는 ‘어머니’같은 존재라고 입을 모았다.
아이들의 양국 문화 체험은 15일 ‘미니문화축제’로 정점에 달했다. 양국 언어로 이름쓰기, 몽골 닭싸움, 한국음식 맛보기와 한복 소개, 사물놀이 공연 등 서로를 아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입는 옷만큼 그 나라의 문화를 알려주는 데 확실한 방법은 없을 거예요. 몽골 친구들이 몽골 전통의상 ‘델’과 비교하며 신기해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운영(18ㆍ분당 이우고 2년), 소연(16ㆍ분당 청솔중 3년) 자매가 한복 맵시를 뽐내며 이렇게 말했다.
짧기만 한 5박6일. 16일 캠프 회향식에서 청소년파라미타 사무총장 선웅 스님이 ‘헤어지기가 아쉽습니까?’란 말에 장내가 숙연해졌다. 그리고 이어진 윤회의 악수. 서로를 안아주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맞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흘리는 눈물도 닦아줬다. 그간 쌓인 정으로 회향식은 이내 눈물바다가 됐다. 양국 청소년들의 만남은 서로의 마음속에 한국과 몽골을 깊게 심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