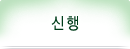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 |||
언제부터인가 선문의 지도자들은 찾아와 묻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거침없이 불법의 대의를 말해주곤 해왔다. 이런 전통은 후학들에게 번뜩이는 깨달음을 경험시켜 주기도 했고 많은 자성의 계기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당처(當處)에서 그 때 그 때 경계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일어난 일들이 많았고 또 묻는 자와 답하는 자 사이에 절대적인 믿음(信)이 있어왔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선(禪)의 성질이 이 순간 순간을 떠나지 않고 펄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 또한 경계 경계마다 비추어지는 대로 중생의 미혹된 습을 칼날처럼 베어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문화와 전통이 세월을 거쳐 내려오면서 옛 사람들이 경험해서 전해온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나머지 어떤 선사에 의해 기록집으로 남겨 놓은 것들이 <벽암록>과 같은 선의 어록들이다.
이러한 선어록들은 선에 대에 굶주린 후학인들의 눈에 배가 고파서 주림을 채우려는 밥인 양 다가가게 해주는 것이 되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은 가끔 본인 자신도 모르게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오면 선이 잘된 것이고 이것이 아니면 먹통이다 라는 문화의식으로 진전되면서, 의리선(義理禪)과 삶 속에 살아있는 선이 구별되지 못할 정도로 오늘날까지 난무해 오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후래 사람들이 귀한 문헌을 의지해 많은 도움을 받아 약이 될 때도 있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선문답 중독증’에 걸려 참 지혜를 놓치고 업식을 끊지 못한 채 의리선으로 살림을 삼게 된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것들은 약이 된 것 못지 않게 병으로 남게 되어 정법을 깨닫는데 혼란을 주게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옛 공안(公案)집에 ‘정병을 건드리지 말고 물을 가져오너라’ 란 문답형 법문에서도 정병이란 경계이다. 이 경계를 손대지 말고 물을 가져오라 하니 깨침이 오기 전에는 덤벼봐야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그런데 선문답을 잘 해내는 사람들 중에는 쉽게도 답을 잘 해내는 사람들도 많다. 답은 잘 해내지만 일상생활의 경계에서는 그 경계를 안 건드리고 살 줄 모르면서 답은 경계 없는 도리를 잘 해내니 이런 선문답을 들어보고는 구별이 안 된다는 점이다. 선이 아니라 다른 별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교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면 무엇 때문에 선이 필요한 것일까가 선명히 드러난다.
대개 요즘은 바른 믿음을 갖추어서 법을 묻는 사람도 드물고 또 선을 지도하는 사람도 경계 경계 속에 그렇게 자유스런 사람도 드물다. 입으로는 공안 문답에 답이 척척 나오지만 본인이 경계에 처하게 되면 꼼짝달싹도 못해서 시끄러운 경계를 사양하듯이 피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용기는 있어 일은 저질러 놓고는 머리와 꼬리가 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 엉뚱한 결과만 남겨놓고는 떠나버리는 경향도 있다.
수행자는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경계를 대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진실이 바탕이 된 양심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입에서 나온 선문답과 삶속에서 일어나는 경계가 따로 있다고 보면 불교가 왜 필요하며 이런 선문답은 어디에 써먹자는 것인가.
이런 썩어 나자빠질 선문답 때문에 선은 소위 선을 하는 전문가 속에 묻혀 들어가 사람 사는 것과 아무 쓸모 없는 것으로 전락 되어 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위들은 옛 선사들에게 부끄럽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참 공부를 했다면 옛사람이 썼던 ‘할’(고함치기)이니 ‘방’(몽둥이질)이니 어록이니 다 집어던지고 경계 속에 살아있는 눈을 갖추어 사람 속에 있는 부처가 나오도록 나투었으면 한다. 옛 틀의 형식을 갖추고 편안함 속에 있기 보다는 틀을 벗어나 지금 시대 살고 있는 문답이어야 선이 다시 살아날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