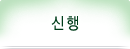우리나라 요가수련장에서 지도하는 요가는 대체로 ‘하타요가’다. 난이도 있는 동작과 그에 따른 호흡으로 대표되는 ‘육체의 요가’. 웰빙바람을 타고 젊은 층에서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한 하타요가는 국내 요가센터를 매개로 확산됐고 몸ㆍ마음 수련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계적인 동작이 담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내 요가지도자들이 특별한 검증의 과정없이 무차별적으로 육성되면서 “하타요가가 수련보다는 체조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하타요가는 뇌와 몸의 완벽한 조화”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안의태(순천향 의대) 교수는 최근 발간된 <요가코리아> 여름호를 통해 “요가는 육신과 뇌의 합일을 통해 고(苦)의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행수단”이라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뇌의 특성을 잘 알고 뇌의 특성에 맞도록 수련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가 주장하는 수련법은 ‘집중’이나 ‘응시’와 관련이 깊다. 그에 따르면 하타요가는 신체의 특정부분을 응시하도록 유도하여 잡념에서 해방시키려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어려운 아사나를 취할 때는 동작을 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긴장과 고통 등의 ‘감각’에 집중한다. 현실의 민감한 사안에 관여하는 뇌의 ‘전전두엽’의 경우 한번에 여러 자극이 동시에 들어올 때는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사나에 집중하면 뇌로부터 현실의 잡념과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안 교수는 “안정된 아사나에 집중하면 교감신경의 작용을 억제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교감신경은 흥분과 관계하고 부교감신경은 안정이나 평화와 연관을 갖는다. 요가는 교감신경의 과도한 작용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심신의 안녕을 이끌어낸다. 안 교수는 “스포츠는 교감신경을 활용하여 불로 불을 끄는 맞불작전이라 할 수 있고, 요가와 기공은 교감신경을 달래고 부교감신경을 활용하여 물로 불을 끄는 소방작전”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집중과 응시는 심신의 안녕 뿐만 아니라 ‘행복’의 감정과도 연관된다. 마라토너가 30분 정도 뛰고 나면 고된 와중에서도 기운이 솟는 ‘runner's high’를 경험하듯, 요가의 아사나를 수행할 때는 힘든 자세를 취하는 가운데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희의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안 교수는 “이것은 뇌의 보호 본능에 따라 배출되는 엔돌핀과 관련돼 있고, 어려운 아사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인도의 요기들은 ‘yogi's high’와 같은 경지를 체험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하타요가를 수행하는 환경에 관한 조건도 덧붙였다. 시각을 받아들이는 ‘후두엽’의 안정을 위해 요가 수행 중에 눈을 감을 것을 권했다. 눈으로 들어오는 색채감으로 아사나의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함이다. 그래서 푸른 산속이나 바닷가를 수련장소로 활용하고 요가수련장의 경우 차분한 색상의 벽지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이와 함께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측두엽’의 기능과 관련, “요가수행을 할 때는 소음이 없는 곳에서 하고 수행 중에 서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 뇌의 집중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