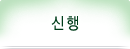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 ||||
‘말(馬)’이란 단어를 알아듣지 못한 빠트삐히 씨(37). 말이 없다고 끝까지 우긴다. ‘정말 없냐’는 연이은 질문에도 돌아오는 대답은 단호하다. ‘없다’는 것이다. 보다 못한 빠이갈 씨(35). 몽골어로 귀띔해준다. 잠시 후, 빠트삐히 씨가 머리를 긁적거린다. “사실 말이 무지 많은데….”
4월 18일 서울 조계사 교육관. 주한 몽골인 노동자들을 위해 열린 ‘즐거운 한글교실’ 강의실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 어눌한 한글 발음, 서툴고 엉뚱하게 말해도 ‘웃음 한방’이면 O. K이다.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에 두 번씩 조계사(주지 지홍)가 마련한 한글교실. 오늘은 몽골인 노동자 10명이 모였다. 강의는 조계종 권안식 국제포교사가 맡았고, 학생은 서울 지역을 비롯해 부천, 수원에서 일하는 몽골인 불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 ||||
한국생활 3년차, 앗띠앙(37) 씨는 조계사가 마치 ‘친정집’ 같다고 말한다. 서울 성수동 주물공장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조계사 한글교실 때문이란다.
3년 전부터 핸드폰 공장에서 일하는 자야(39) 씨도 한 마디 거든다. “보름에 한번은 꼭 고국에 가요. 조계사가 바로 그 곳이예요. 부처님과 동포들을 볼 때마다 서글픔은 기쁨이 돼요.”
그리고 이어진 정기법회. 몽골인 짬바 스님과 뭉크어칠 스님이 몽골전통 불교의식에 따라 집전을 한다. ‘문수보살찬양게’를 외우고, 몽골어 법문을 듣는다. 공간은 한국이지만, 시간은 고스란히 몽골을 옮겨다놓았다.
“법회와 한글교실은 우리 동포들에게 중요해요. 그동안 신행활동을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 다른 종교시설을 기웃거렸어요.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몽골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몽골인임을 잊지 않는데 큰 힘을 얻고 있어요.”
짬바 스님이 법회와 한글교실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 ||||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돈을 벌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 까지 말 이예요. 소원 한 가지도 더 올렸죠. 우리 아들이 밝고 아름답게 클 수 있도록….”
한국에 온 지 5년 된 엥헤(36) 씨. 열두 살 된 아들 하스일딘의 걱정에 눈물을 훔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