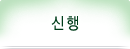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다. 처염상정(處染常淨), 흙탕물에 살아도 그 더러움을 조금도 자신의 꽃이나 잎에는 묻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 관내 공중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여성 불자들이 힘든 일과와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원주 소쩍새 마을의 장애자들이 자신들보다 더 불행하다며 10년 동안 남몰래 도와 온 일이 뒤늦게 밝혀져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은 연꽃의 이치와 같다.
공중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하루 9시간을 보내지만 아름다운 자비의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연꽃 같은 이들은 바로 이명자(57, 은평구청 불심회 봉사부장), 김종림(44) 씨 등 8명의 ‘빗자루 아줌마’들. 이들 대부분은 남편이 모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남편 대신 빗자루를 들고 어렵사리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번듯한 셋집에 사는 사람들도 손꼽을 정도이지만 나눔 속에서 행복해 한다.
"우리 보다 더 불행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만도 행복"이라는 이명자 씨는 “공중화장실 청소만을 20년 넘게 하면서 한 가지 터득한 게 있다”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순리를 지키며 살아가면 그 만큼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남들의 눈에는 공중화장실 청소하면 그저 천한 일로만 비쳐질 수 있지만 이들에게 이곳은 ‘그냥 볼 일보는 그런 곳’이 아닌 순리를 배우는 도량이다.
오전 8시 30분 연서, 불광1, 증산3, 갈마공원, 대조공원, 구산1 등 자신이 맡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도착하는 빗자루 아줌마들에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화장실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휴지와 담배꽁초다.
화장실 집기가 역기 여기 저기 부서져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자기네 집 화장실이라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인데 내 것 네 것 따지는 ‘이기심’ 탓에 공중화장실이 하룻밤 만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다는 것이다.
1시간 남짓 바닥의 쓰레기를 치우고 세제로 변기며 세면대 등 화장실 곳곳을 닦고 나면 전쟁터 같던 공중화장실에 윤기가 돈다. 그러나 이도 1시간이 채 못 간다. 사람들 대부분이 휴지통이 옆에 있어도 휴지를 바닥에 버리거나 담배 피면서 침 뱉는 게 일상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명자 씨는 “처음 이 일을 했을 때 하룻밤사이 전쟁터가 되어 버리는 공중화장실의 모습에 질려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절망이 들었다”며 당시의 괴로운 심정을 털어 놓았다.
그런데 이 씨의 갈등은 공중화장실에서 골판지를 깔고 잠을 자는 노숙자를 본 순간 사라졌다. 자신이 청소하는 공중화장실을 생활처로 의지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놀라움과 뿌듯함을 느낀 것이다.
“이 일로 세상살이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 씨는 “공중화장실 청소에 긍지를 가지는 것은 물론 퇴근시간이 돼 녹초가 되어버린 몸과 마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의 생각은 김종림, 박정순(60), 김정애(59), 이금선(38), 김정애(43) 등 8명의 불자 미화원에게 또다시 다른 13명의 여성 미화원에게 전이됐다.
혹시나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일했던 이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떳떳하기만 했다.
이명자, 김종림 씨가 91년 3월 강원도 치악산 기슭의 소쩍새마을을 방문할 수 있었던 원력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 삶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라면 폭을 넓혀 더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TV를 보다가 소쩍새 마을을 알게 됐다.
소쩍새마을은 정신 지체 아동과 장애자 2백 여 명이 모여 사는 장애인 집단촌으로 뇌성마비로 태어난 후 3개월 돼 버림받은 젖먹이부터 치매로 자식에게 버려진 칠순노인까지 절반이상이 항상 간호할 사람이 필요한 중증 장애자들이다.
물어물어 소쩍새마을을 찾아 갔다는 이명자, 김종림 씨는 “가서 보니 진짜 비참했어요. 그래도 직업이 있어서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우리는 행복하더라구요.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그 한가지만으로도 복받은 사람이죠”라고 말했다.
두 사람을 통해 소쩍새마을의 장애인들이 비닐하우스 천막에서 추위 속에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전해들은 여성 미화원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십시일반으로 매달 1만∼2만원씩 가난한 주머니를 털었다.
모두가 가난하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았다. 처음에는 월 후원금을 5만원부터 시작해 12만원, 15만원씩으로 매년 후원금을 늘려왔다. 9
5년 소쩍새마을을 이끌던 일력스님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되자 이들 사이에 한때 후원을 그만두자는 말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후원한 것은 소쩍새마을이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불우한 장애자들”이라며 후원을 계속했다.
97, 98년 IMF 한파가 몰아칠 때에도 “두부 한모, 콩나물 값을 깎더라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자”며 후원금을 늘려 매달 20만원씩 보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에서 정성을 모은 값진 후원금이다. 이들은 1년에 3~4회 정도는 공휴일 등을 이용해 밑반찬, 치약, 세제, 밀가루, 내복 등을 사들고 소쩍새 마을을 직접 찾아가 정이 그리운 장애 아동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 흔한 자동차가 없어 이들은 지금껏 원주까지 기차와 시외버스를 번갈아 타고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온다. 소쩍새마을을 다녀온 며칠동안 눈이 퉁퉁부어 있다. 장애인들이 너무 가엾고,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서다.
그나마 직장에 얽매여 자주 찾지 못하고 있어 늘 마음 아프다. 소쩍새마을을 다녀온 이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지긋지긋한 가난도 남편의 오랜 병간호도 이곳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 비하면 ‘그래도 행복한 고민’이라며 위안을 한다.
“욕심이란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다섯 가지 욕심 중에 한 가지를 얻었다고 해서 네 가지 욕심이 남겠습니까? 여전히 다섯 가지 욕심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라는 이명자 씨는 "힘들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나눌 수 있냐는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 일은 부처님이 제게 주신 천직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땅거미가 지는 저녁, 하루의 피로가 어둠으로 깔릴 때 하루 일과를 마친 여성 불자 미화원들이 비탈길을 내려오다 문득 멈춰 선 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한 순간도 똑바로 설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그들은 하루치의 양식에 감사하며 이웃을 위한 내일의 노동을 준비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