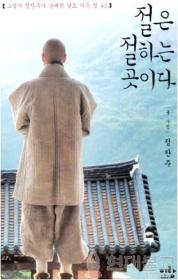| |||
노악산 남장사의 소박한 법당은 자기 내면에 자리한 누군가를 만날 때까지 마룻바닥에 앉아보라고 권하는 듯하다. 죽은 지아비를 닮은 수행자를 사모하다 결국 병들어 죽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전하는 모악산 용천사는 절보다 여인이 꽃으로 환생했다는 꽃무릇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욕심도 사랑도 미움도 다 버린 무욕(無慾)의 얼굴을 한 영구산 운주사 ‘거지부처’는 저절로 그 앞에서 발을 멈추고 합장하게 만드는 이상한 힘을 지녔다.
책은 소설가 정찬주가 전라도와 제주도의 작은 절들을 인연 따라 조우한 순례 기행문이다.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가 아닌 바로 자기가 자신 스스로에게 추천한 절들의 여정이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다. 때론 범종각 앞에 서서 명상에 잠기고, 짧지만 범종소리에 온갖 잡념이 사라짐을 느낀다. 선방산 지보사 배롱나무 꽃무더기 속에 자리한 석탑에서는 무위(無爲)를 발견하고, 비슬산 유가사에서는 바람으로 마음을 읽는 것이 풍류임을 배운다.
또한 모후산 유마사에서는 살아 있는 부처를 무서워하라는 단순한 깨달음을 얻게 되며, 조계산 송광사와 같은 이름을 가진 종남산 송광사에서는 절의 위의나 품격은 도량의 크기가 아니라 주름살이 진 건물에서 찾아야 함을 알게 된다.
저자는 이 같은 여정들이 자신을 맑힐 예수재(豫修齋)란 생각에 법당에 들어 절하는 것이 더욱 절절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곳이 ‘아! 절은 절하는 곳이구나’라는 단순한 깨달음도 얻는다.
어느 선사는 ‘도를 모르고서 발을 옮긴들 어찌 길을 알겠는가’라고 말했다. 결국 참된 나와 만나는 행복의 여정은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된 저자는 작은 절을 찾아가는 길이 내면에 자리한 ‘참된 나’를 만나는 구도의 여정임을 알게 된다.
묵은 절의 주름진 기둥, 칠이 벗겨진 단청, 고승의 절창이 남아 있는 산 속 작은 절에서 저자는 홀연히 깨닫는다. 불상은 우상이 아닌 순간적이나마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을 씻고 홀연히 만나 미소 짓는 우리 내면의 자화상임을, 그리고 부처님은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이야기한다.
| |||
절은 절하는 곳이다|정찬주 지음|이랑|1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