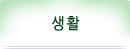“아직도 하늘은 파랗구나. 20년 전과 꼭 같이, 그렇게 파랗구나.”
| ||||
흐르는 구름과 살랑이는 바람마저도 ‘과거’ 속에 묻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현재에 살도록 할 수는 없을까. 장애인의 파란 눈물을 목격한 김정희(68ㆍ부름의 전화 대장)씨는 ‘외출이 중증장애인 재활의 시작’이라는 일념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시작했다.
“10~20년, 많게는 40년까지 골방에 갇혀 세상 빛을 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밖을 나서려는 장애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전화로 자원봉사자를 연결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요. 그들의 ‘부름’에 행동으로 답하는 ‘부름의 전화’ 말입니다.”
부름의 전화를 창설할 1987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시설 위주의 복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재가(在家) 복지라는 개념은 전무한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시설을 찾을 수 없는 이들은 집에 틀어박혀 몸과 마음의 병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지금처럼 엘리베이터가 흔한 것도 아니었고, 휠체어를 탄 채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김 대장은 이러한 현실에 맞서 시설 밖 장애인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 ||||
그렇게 살아오기를 20여 년. 쥐고 있던 지갑은 밑빠진 독처럼 가벼워졌고 그 성성하던 머리는 하루가 다르게 세어갔다. 그러나 그의 아름다운 외출에 동참하는 이들은 나날이 늘어갔다. 불교방송의 장애인 포교 프로그램인 ‘꺼지지 않는 등불’을 7년 동안 진행한 덕도 봤다. 장애인을 팔아 돈을 모금한다는 오해가 싫어서 그 흔한 지로용지 하나 발급하지 않았건만, 후원금은 차곡차곡 쌓여갔고 ‘부름의 전화’에 동참하는 자원봉사자의 수도 4천 명을 훌쩍 넘겼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지금도 ‘부름의 전화’를 찾은 봉사자와 장애인의 수는 여전하다. 왜일까.
“약을 대신 타다주고, 서류를 대신 발급해 주는 식의 도움은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봉사자들은 그들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그늘 때문에 스스로 묻어버린 그들의 능력에 새롭게 빛을 주는 것이죠.”
보행이 어려운 이들의 다리가 되어 주는 것만이 도움이 아니다. 김 대장은 근육의 움직임이 살아있는 다리를 감지하고 그 약동하는 근육의 핏줄이 된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나도 걸어보겠다’는 발심이다. 김 대장은 나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놓지 않도록 한다. 애초에 죽은 근육은 없다. 내 생각이 미치지 않아 잠시 활동을 멈춘 근육이 있을 뿐이다. 혈관 한 곳에 고여 있었던 피가 철철 흘러 온 몸을 덥히는 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라는 믿음, 그것이 ‘부름의 전화’가 장애인들에게 전한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
그러나 귀한 선물에 대한 보답이 그리 달지는 않았다. “봉사자들의 삶이 아름답고 거룩하기만 할 것 같습니까? 9번 잘하다가도 1번의 실수가 있으면 금세 싫은 소리를 듣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으면서도 어느 병원에 가는 것인지 궁금해 하면 언짢아하며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 |||
장애인들의 사회 환원 문제도 김 대장에겐 넘길 수 없는 과제였다. 그는 농한기에 농촌 마을회관을 찾아 장애인들이 안마와 침술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장애인들은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회에 자신을 회향할 수 있는 존재라는 판단에서다. “침술 현장에서 자신들에게 ‘장애인’이 아닌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붙는 것을 보고 대단한 자긍심을 느껴요. 봉사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귀한 성취가 아닐까요.”
결혼도 자식도 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내달린 50년. 그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리도 열심히 달려왔을까. “산이 거기 있으니까 갈 뿐이죠.” 그렇다면 단체도 후원회원들의 후원금에 의지해서 가까스로 꾸리는데 개인의 생활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일까. “스님이 입을거리 먹을거리 걱정하는 것 보셨나요. 걸망매고 길을 나서면 심신 추스릴 곳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런 그가 이번 달 말에는 민통선 안에 들어가 장애인들과 함께 15km걷기 극기훈련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벌써 5회째 진행되는 행사다. 무더운 날 뙤약볕 아래에서 진행되는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를 넘은 도전’이 될 것이란다. 극복할 무엇이 있어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 생(生)이라며 환하게 웃는 그에게 오늘도 전화가 따르릉 걸려온다. “이비인후과를 같이 갈 외출 도우미가 필요하시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