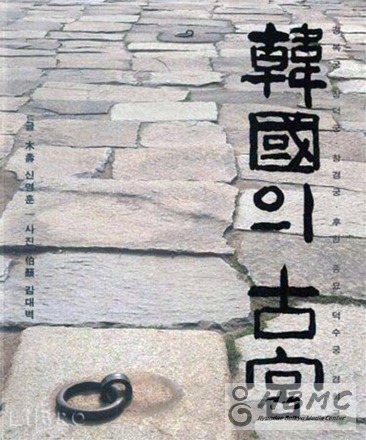| ||||
“강녕전 바로 뒤가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이다. 교태전 대문은 양의문으로 강녕전 대문인 향오문과 그 시설이 다른데, 특히 문짝이 눈에 띈다. 향오문 문짝은 아주 투실한 판선형의 두짝문으로 둔중한데 여기문은 6짝으로 가볍게 구조하여 여인들도 힘들이지 않고 여닫게 했다. 이런 구조를 무심히 보면 그 따뜻한 배려를 모르고 말게 된다. 여인들을 위한 이런 씀씀이를 알아야 한국인의 심성과 한옥을 알게 된다.”
경복궁
| ||||
그런 시선으로 쓴 책 <한국의 고궁>은 우리 궁궐 구석구석의 조형미를 오롯이 담아냈다. 서울에 남아 있는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그리고 동궐의 후원, 종묘 등 모두 7곳. 빼어난 영상으로 담아낸 384컷의 사진에 만든 이의 생각과 살던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내 주는 글로 궁궐의 아름다움과 조영 의식을 천착했다.
요즘은 고궁마다 시간대를 잘 맞춰가면 안내자들의 해설을 들으며 편하게 고궁을 둘러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으로 예습하고 궁궐을 돌아본다면 구석구석까지도 상세히 즐길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까. 실제로 책장을 넘기다 보면, 무심코 지나친 고궁의 문화재들이 “아 그런뜻이 담겨 있었구나” 하는 발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는 대목이 적잖다.
| ||||
| ||||
창경궁 정문인
| ||||
그렇다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의 정전은 어떨까. 임금의 고(高)·증(曾)·조(祖)·부(父) 4대와 태조 등 나라에 큰 공덕을 세운 임금의 신주를 모셨던 이곳은 19간이나 된다. 거대한 규모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다는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 책에는 고궁에 대한 안내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부족과 그 문제점도 실랄하게 지적했다. 창경궁의 경춘전은 대비의 침전이다. 그런데 내부를 보면 완전히 트고 전체를 마루로 깔았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변형한 것이다. 지은이는 “마치 일본 순사들의 무술도장 같은 분위기다. 무엇이든 복원하기를 좋아하는 문화재청이 왜 이곳만큼은 원형을 복원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꼬집는다.
| ||||
현재 빈 공간도 많고 규모도 커 보이지 않는 우리 궁궐이 원래 그랬던 건 아니다. “1915년 산업을 장려한다고 전각을 헐어내고…” “1918년 간특한 무리들이 창덕궁 내전에 불을 질러 타버리자 경복궁의 침전을 옮겨 다시 짓는다고 자경전 일곽을 제외한 내전을 헐어내는 바람에…” 등에서 짐작할 수 있듯, 고궁에도 일제 야만의 흔적이 생생하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복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총독부 따위를 들어앉혀 오히려 문화적 열패감을 반증한 저들의 빗나간 행태가 새삼 가엾다. 이 대목에선 요즘 한창 독도문제로 인한 반일 감정이 더 솟구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책 중간중간에 멸실된 전각 형태를 직접 펜으로 그려 넣은 궁궐 배치도. 궁궐의 소재와 전각의 위치 명칭 연혁 등을 수록한 ‘궁궐지(宮闕志)’를 토대로 현재 남아 있는 것과 사라진 것을 표시해 궁궐들의 원래 규모가 현재처럼 옹색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준 것은 이 책의 큰 친절이다. 갖고 다니기엔 다소 무겁지만 분철해서 가고자하는 궁궐에 들고 간다면 더없이 훌륭한 궁궐 안내서가 될 것 같다.
■ <한국의 고궁>
신영훈 지음 | 김대벽 사진
도서출판 한옥문화 | 4만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