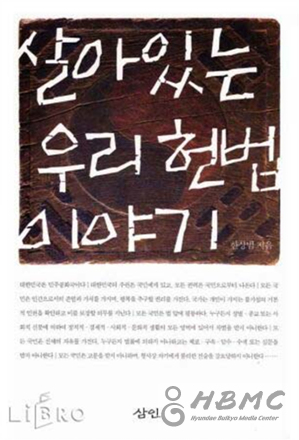| ||||
또한 ‘시민을 위한 헌법 교과서’를 표방하며 학자나 법조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편에서 헌법을 해설하고 자신의 견해를 붙인 것도 독자들이 편하게 책장을 넘길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지은이에 따르면 헌법은 ‘권력자의 족쇄이자 시민의 무기’라고 강조하고 헌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어 권력자의 욕심에 의해 훼손되고 칼질 당한 사사오입, 3선 개헌, 유신헌법 등 우리의 헌정사를 훑어보면서 어느 규정이 개헌의 핵심이고 어느 규정이 장식 문구에 불과했는지 대담하게 폭로한다. 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일본의 메이지 헌법과 독재의 잔재도 비판한다.
우선 그는 1948년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 조선총독부 법제가 식민지 탄압과 봉건 잔재가 결합돼 있는 사이비 근대 법제였고, 광복 후에도 우리 손으로 이 잔재를 철저하게 청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더 큰 문제는 군사정권이 이어지면서 ‘정치권력자의 권력 행사를 규제’하는 것이 본디 목적인 헌법이 ‘시민의 무기’가 되지 못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둔갑한 점이다.
1996년에 검찰이 12ㆍ12 쿠데타 주역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성공한 쿠데타’는 내란이 아니라는 법리를 내세운 것을 두고 그는 “이미 대통령이 되어 버렸으니 기정사실로 수긍해야 한다는 것은 힘의 논리에 굴복한 결과”라며 “군사정권 30여 년은 법률가에게 힘의 논리에 굴복해서 법철학 자체를 포기하는 법적 허무주의를 심어 놓았다”고 한탄했다. 대표적 언론 탄압 조항인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죄와 불고지죄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수사과정에서나 재판에서 이런 법리가 소용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대통령제와 국회, 헌법재판소 관련 조항의 문제도 꼬집었다. 대통령의 경우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이고 필요할 때에 계엄권과 긴급명령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은 일본 메이지(明治) 헌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우리 헌정사를 돌아볼 때 남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대통령 유고시 비록 60일의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행정관료인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도 법의 큰 맹점이다. 특히 헌재 재판관을 두고는 “헌법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결정문은 재판관을 지원하는 연구관에 맡겨서 외국 이론의 선례로 수식하여 작품을 만든다” 등 쓴 소리를 쏟아 부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자부심을 가질 대목도 많다는 평가는 의미 심장하게 다가온다. “우리 헌법 전문에 언급된 3·1운동과 임시정부 정신, 4·19 이념은 장기간에 걸친 투쟁의 산물이었으며, 이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로 시작되는 일본의 헌법보다 훨씬 자랑스러운 것입니다.”라는.
■ <살아있는 우리 헌법이야기>
한상범 지음
삼인 펴냄/1만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