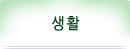| ||||
수경사 일주문에 버려진 ‘포대기’들
식구가 늘었다. 두 살배기 아기와 열한 살짜리 소녀. 지난달 14일부터 수경사의 가족이 됐다. 이름도 새로 지었다. 윤점, 윤화. 윤점은 온 몸이 점투성이라서, 윤화는 미소가 꽃보다 예쁘다 해서. 가족이 여덟 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7월 25일에 들어온 윤경이를 비롯해 10월 6일 윤주, 10월 24일 사내 쌍둥이 윤권이와 윤수, 11월 24일 윤진이, 12월 19일 윤성이까지. 이제는 ‘여덟 남매’가 됐다.
“고양이 소린 줄 알고 혹시나 싶어 나가 봤더니 포대기에 둘둘 말린 윤성이가 있더군요. ‘누가 또 아이를 놓고 갔구나!’ 일단 안고 들어와야 했지요.” 무인 스님은 포대기에 얽힌 사연들을 담담히 풀어헤친다.
절로 보내진(?) 아이들은 하나 같이 작고 약했다. 병원 인큐베이터 신세를 저야 했지만 어려운 절 살림에 꿈도 꾸지 못했다. 젖병을 무는 것조차 힘겨워 하는 아이들이었다. 이런 아이들에게 무인 스님은 우유 한 방울, 한 방울을 입가에 적셔 먹였다. 아흔의 노구인 청오 스님도 곱추처럼 굽은 허리를 마다하지 않고, 우는 아이들을 안아 어르고 키웠다.
“모두들 건강해 보이지요? 잘 크고 있는 얘들이 고마워요. 아마도 버려진 만큼 생존 본능이 얘들을 더 악착같이 살게 했나 봐요. 끝끝내 놓지 않는 생명력에 경외감을 느끼게 됐지요. 힘든 세상에 보듬어야할 인연들이 많아요. 버려야 할 만큼의 비정한 사람도 있지만, 끌어안아야 할 사람도 있어야지요” 노스님이 머쓱한 웃음을 내보인다.
‘아흔의 노구’ 청오 스님과 ‘여덟 남매의 엄마’ 무인 스님
| ||||
스님들의 하루도 죄다 아기들 것이 됐다. 이른 새벽, 인근 약수터에서 약수를 길어다 우유 물 준비하는 것부터 수십 개의 젖병과 산더미 같은 세탁물까지, 스님들의 정신을 쏙 빼놓았다. 쉰 살에 늦깎이로 삼선승가대 4학년이 되는 무인 스님이 오전에 학교에라도 가게 되면, 아기들은 더 울어댄다. 무인 스님 손에 익은 까닭이다. 윤화가 동생들을 어르고 안아보지만 별 소용이 없다. 그래도 청오 스님은 내버려 둔다. 무심할 정도다. “아기는 크게 울면서 커야 노래도 잘 부를 수 있어.”라는 말로 난감한 상황을 애써 평상으로 받아들이시는 느낌이 역력하다. 그러면서도 청오 스님은 젖병 삶는 것부터 아이들의 목욕 물 데우기, 분유 타기, 빨래까지 아이들의 시봉(?) 만큼은 마다하지 않는다. 다만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을 뿐이다.
“잔정에 매달릴 수 없어요. 일곱 아이들을 하나하나 보듬어 줄 수 없는데, 손까지 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고 어르면 어를수록 아이들을 보살피기가 더 힘들어져요.”
| ||||
“하루가 멀다 하고 얘들이 예쁜 짓을 해요. 먹물 옷을 입고 있어 세속적인 인연과 거리가 있겠지만 정이 가는 것은 사실이예요. 아마도 전생부터 모자의 연을 인연이어서 이곳으로 왔나 봐요.”
‘한번 버린 아이를 두 번 버릴 수 없다’
무인 스님은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도 늘었다. 먹고 입히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엄마’ 노릇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점이와 윤화를 받을 때, “여덟은 자신 없어요.”라고 말했다가 청오 스님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은 터였다.
청오 스님은 단호했다. “한번 버려진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두 번 버리라고요? 그러려면 얘들을 다 버리세요.”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고 다시 태어나라고 이름도 새로 지어준 스님이었다. 분유가 떨어지면 아흔의 노구를 이끌고 추운 거리에서 탁발까지 했던 스님이었다.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 예요. 받을 것을 받고 있을 뿐인 거죠. 아이들이 울면서 우리에게 염불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절 앞에 버려졌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수행의 일부분이라는 두 스님. 이 아이들이 건강한 젊은이들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두 스님은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직은 세상은 살만하다. ■후원계좌 019-054705-02-020(예금주 김진우) (02)359-5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