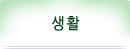“영감님은 나보고 차라리 죽으라고 했어. 순규 놈은 잘 보살필테니 편히 가라고. 그러면서도 때 되면 밥 떠 먹여 주더라구. 살아야 한다고…. 그러던 영감이 먼저 가다니…. 나 죽으면 아들놈은 어떡한다지? 아들놈하고 같이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 한날한시에 죽으면, 아들놈 혼자 남지는 않을 거잖아….”
실향민 장정옥 할머니(72). 마흔이 다 된 선천성 뇌성마비 아들 최순규(39) 씨와 서울 면목동 14평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10년 전 중풍을 앓으면서 누워 지내던 장 할머니가 6년 만에 그나마 앉아서라도 생활할 수 있게 된 사연을 풀어놓는다.
“갑자기 쓰러져 누워 지낼 때, 영감님이 나하고 아들놈 수발 다 들었지. 동네 사람들은 다들 내가 곧 죽을 거라고 난리들이었어. 그런데 말이야, 영감도 영감이지만 아들놈을 두고 차마 죽을 수는 없었어.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
이렇게 장 할머니의 와병 생활이 이어지면서 살림은 전적으로 남편 최 씨의 몫이 됐다. 낮에는 공공근로에 나갔고, 밤에는 두 모자의 뒷수발을 다 들어야 했다. 급기야 두고 온 고향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남편 최 씨는 술로 지내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남편 최 씨가 떠난 빈 자리. 그 자리에 뇌성마비 아들 최 씨가 자리 잡았다. 아들 최 씨가 장애인 판정을 받기까지의 사연도 참 기구하다. 집밖 출입을 전혀 못하던 장 할머니가 중랑보건소에 민원편지를 보냈다. 딱한 사정을 접하게 된 보건소에서는 직접 출장을 나와 아들 최 씨의 증세를 진단하고 장애등급 판정을 내주었다. 하긴 두 모자가 비좁은 방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지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들 최 씨가 ‘호된 바깥나들이’를 한 적도 있다. 최 씨가 8살 때, 장 할머니가 잠시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리고는 4일간 연락이 없었다.
“초상난 집처럼 영감님하고 4일 동안 밤낮으로 통곡한 채 지냈었지. 우연히 라디오 방송에서 미아를 찾는 내용의 방송이 나오더군, 거기에 아들놈의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다시 찾았어.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찔하다구.”
부채를 집어든 장 할머니의 오른손이 계속 떨린다. 한 마디 내뱉는 말조차 힘겹게 그지없다.
이들 두 모자가 이 정도라도 연명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3년 전이다. 바깥출입이 어렵다보니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조차도 불가능했다. 어렵게 이웃의 도움으로 이들은 정부로부터 한 달 지원금 30만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아파트 임대료, 공과금 등 기초생활비로 20만원을 빼고 나면, 반찬비는 커녕 병원비도 마련하기 힘들다.
남편 생각과 아들 최 씨 생각만으로도 미어지는 가슴을 쓸어내리기 바쁜 장 할머니. 먼저 간 남편에 대한 원망도 원망이지만,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장 할머니의 마음은 미어진다.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면목4동 면목도시개발아파트 3동 413호
전화번호 : 02-439-2460
후원계좌 : 한빛은행 139-082921-12-101(예금주 장정옥)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